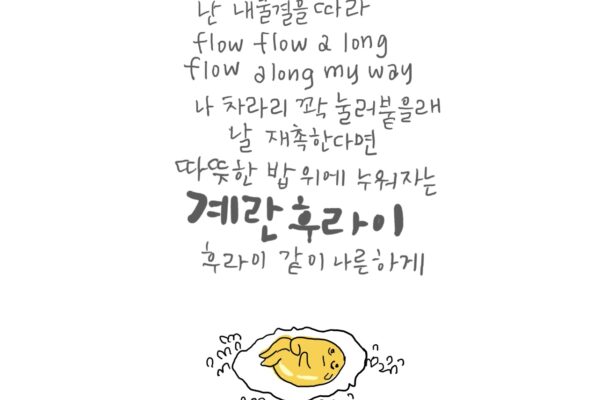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는 버려진 아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얽힌 이야기이다. 개봉 전부터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꽤 떠들썩했던 작품으로 기억한다. 감독의 작품도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데다가, 출연 배우들도 연기력이나 호감 면에서 충분히 기대할만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개봉하면 바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송강호의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개봉 후 그다지 재미있지 않다는 평이 많았고, 일도 바빠져서 결국 영화관 관람을 놓치고 말았다.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다가 살짝 갠 토요일 아침이었다. 창을 여니 한여름 답지 않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하지만, 나갈 생각은 없었다. 언제 또 갑자기 구름이 해를 가리고 비를 쏟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이번 주에만 서너 번 속았다. 대충 아침을 먹고 빈둥거리던 나는 IPTV에서 이 영화를 발견하자마자 고민 없이 플레이시키고 말았는데, 사실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다 날씨 탓이다.
영화는 잔잔했다.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친구를 졸라 같이 보러 갔다면 내내 조바심이 났을지도 모른다. 친구가 마블 영화처럼 번쩍거리는 화면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박찬욱 영화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에 소름이 돋을 일도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대신 재미있게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영화관에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 국룰이니까. 하지만, 거실에서 혼자 보고 있으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조용히 스크린에 집중했다.
송강호는 능구렁이다. 그의 영화라면 딱히 시놉시스나 추천 리뷰 확인 없이 관람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연기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너무 익숙했다. 기생충의 송강호가 여기에 그대로 있었다. 잘생긴 강동원은 살짝살짝 연기가 각져 보여 어색했다. 연기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잘 생긴 게 거슬렸던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배두나의 생각과 대화를 동시에 하는 듯한 캐릭터 연기가 좋았다.(그건 그녀의 평소 모습이기도 하다.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음) 대사를 웅얼거리는 바람에 잘 안 들렸다고 불평하는 리뷰를 꽤 봤지만, 나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늘 대화를 상대방의 귓구멍에 꽂아 넣는 건 아니지 않나? 피곤해. 아이유는 욕이 자연스러워서 시원했다. 그리고, 월미도 대관람차에서 머그샷 재연을 위한 강동원의 손을 그대로 잡는 연기에서 심장이 아렸다. 상대의 손을 덥석 잡았던 건 정말 찰나였는데, 대사도 없던 그 장면의 연기가 좋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나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됐다. 이 영화 보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장면 때문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한 감정의 변화가 비약적으로 그려진 부분은 분명히 있다. 두 시간 안에 정리하기에는 숨이 긴 시나리오다. 러닝타임이 조금 더 허락되었다면 감독이 원하는 흐름으로 영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관객들은 더 지루해했을 것이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좋았다고 말하고 싶은 고래에다 히로카즈의 ‘브로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