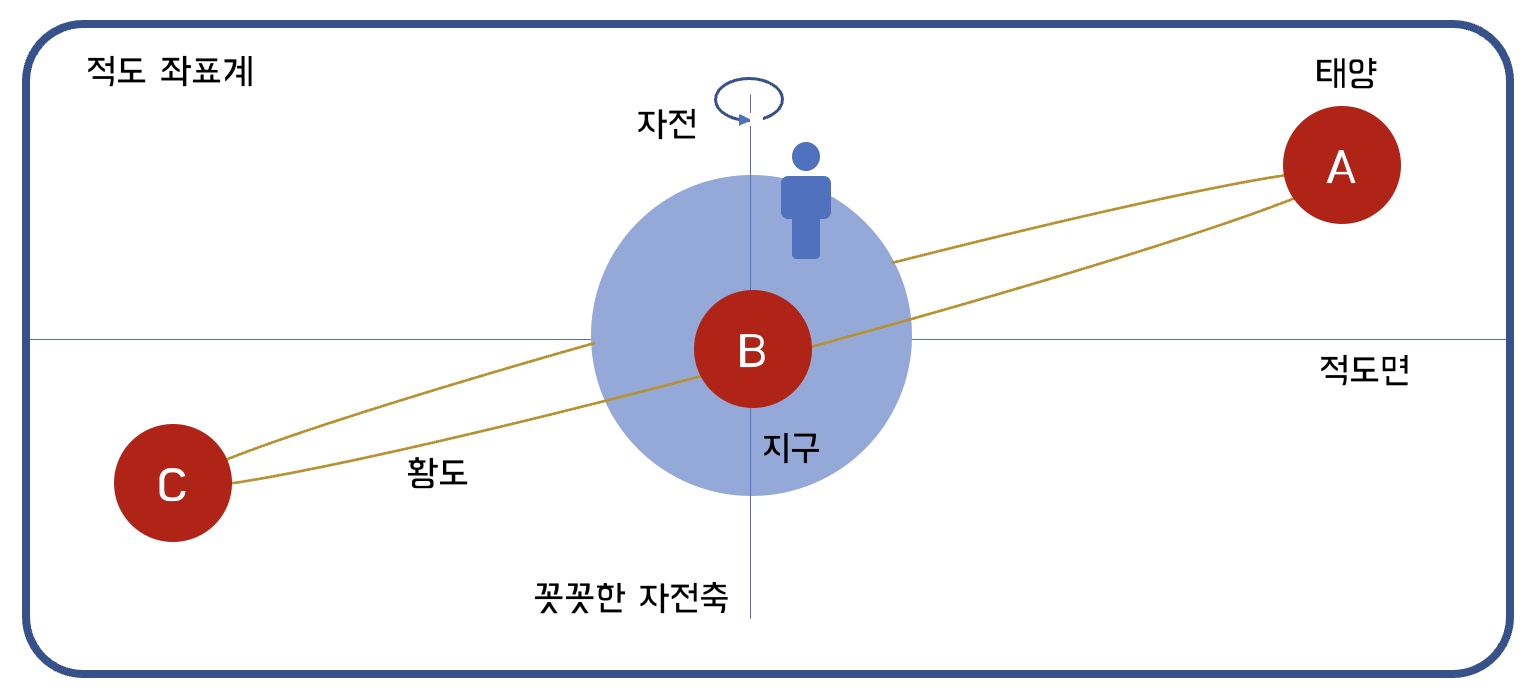오늘은 2023년 11월 5일로 페이스북에서 띄워 준 이 시기에 썼던 과거 글을 보면 대부분 분위기가 겨울겨울 하다. 강아지가 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도 그렇고, 힘들게 프리퀀시를 모아 받은 크리스마스 장식 옆 스타벅스 다이어리 사진도 그랬다. 과거 사진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벌써 11월이다. 11월은 여름일 수가 없잖아.

하지만, 올해 계절은 분명히 평년과는 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어제까지는 확실히 꽤 따뜻했다. 재단에서 개최한 조혈모세포 걷기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반팔을 입고 오지 않은 걸 후회했을 정도였다. 한참 걷다 보니 상의 안쪽이 후끈후끈해졌다. 걷는 줄만 알았는데 중간중간 멈춰 세워서 인간 하트를 만들라고 하거나 바닥의 색깔 뒤집기 경기를 할 때는 행사고 뭐고 도망치고만 싶었다. 남의 지시로 많은 사람들과 지네처럼 하트를 만들어야 하는 게 영 내키지 않았는데, 같이 간 동료가 카메라를 보고 양손으로 하트까지 만들어주며 좋아하는 걸 보면서 역시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싶었다. 물론 하트가 중요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행사가 끝나 저녁을 먹을 때까지도 상당히 후덥지근했었다는 거.
오늘 아침 카페에 잠깐 앉아있는데 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다. 집에는 어떻게 돌아갈지 고민하면서 일기예보를 보다가 다음 주는 완전히 겨울 날씨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잠깐만 대체 이게 뭐지? 올해는 가을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어제까지는 여름이었으니 말이다. 올해 준비한 가을 옷은 입을 시간도 없다. 요 며칠간 몇 번 시도했다가 더워 다시 넣어뒀던 옷들도 마치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아니 지난 몇 년 꼴을 보면 내년에도 입지 못할 가능성이 꽤 높다. 이제 앞으로는 매년 11월 5일까지 반팔 티셔츠를 입다가 그다음 날부터 패딩을 주워 입으면 된다. 이제 가을 옷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계조階調가 사라져 버리다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언젠간 후손들이 내게 가을이 뭔지 물어보는 때가 오겠지?
‘아저씨가 어렸을 때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었어. ‘여름’과 ‘겨울’ 사이에 말이야. 응 맞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거든. 고어사전에는 있을걸? 복장은 아마 반팔셔츠에 바람막이 같은 아우터를 걸치거나 적당한 두께의 맨투맨만을 입기도 했던 것 같아. 사람들은 한강에서 바람을 즐기며 치맥을 먹기도 했고 말이야. 이탈리아의 시인, 빈센조 카다렐리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어. 이해가 안 갈 거야 너희들은. 가을이 뭔지 경험을 못했으니까.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도 있었다니까? 무슨 뜻이냐고? 상상을 해봐. ‘여름이 오면’ 같은 뉘앙스에 여름을 가을로 바꿔 생각해 보면 되잖아. ‘가을’이라는 그룹도 있었어. 아 미안, 그건 ‘노을’이구나. 알베르 카뮈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라고도 했지. 응? ‘봄’이 뭐냐고? 그건…
제발 봄까지 없어지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