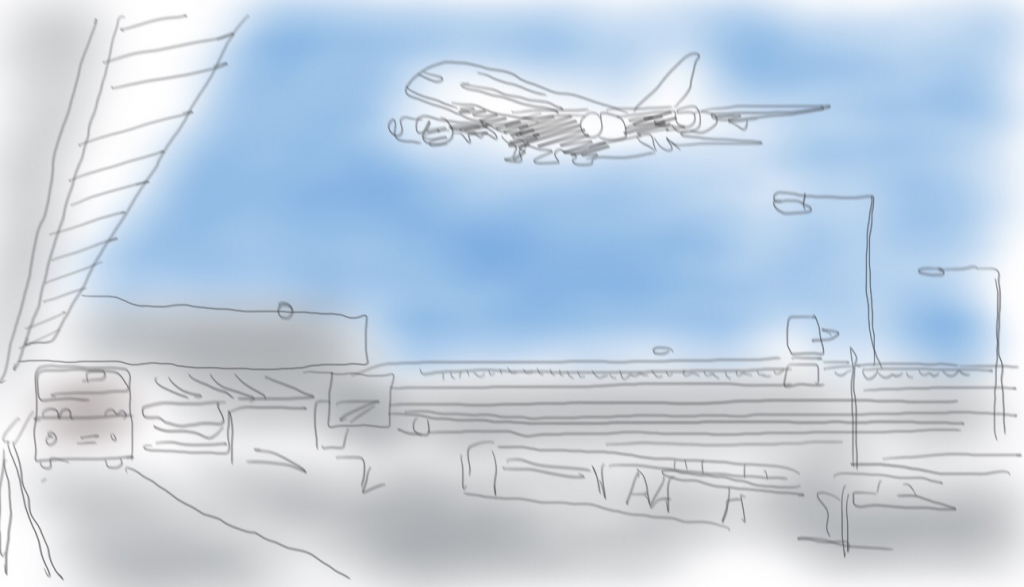
나는 공항에 가는 게 좋아
오늘처럼 날씨가 풀리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온몸을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이 아픈 감기에 걸렸던 날이었다. 다음 날은 시험이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단지 도서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했던 그런 날. 건너편에 앉아 두꺼운 전공 책을 앞에 두고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가 갑자기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공항에 가는 게 좋다고.”
“공항?”
홋카이도에 가서 내리는 눈을 맞으며 온천욕을 하고 싶다던가, 호주에 가서 더워 죽겠는 크리스마스를 맞고 싶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응, 공항”
확실히 ‘공.항’이었다.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생활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 시간이 다른 곳보다 천천히 흐르는 공간. 세상 어디를 가든지 잠시는 머물러야 하는 공간. 떠나는 공간. 돌아오는 공간. 세상과 세상의 중간.
“지금 갈까?”
어차피 머리가 아파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있어 봤자 내일 시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다. 공항에 가는 게 좋으면, 공항에 가면 된다. 우리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근처 정류장에서 공항버스를 탔다. 감기 기운이 있던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공항에 가는 내내 잠이 들었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그녀는 나를 살짝 흔들었고, 아직 잠이 덜 깬 나는 잘 떠지지 않는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던 공항은 넓고, 차갑고, 쓸쓸하고, 가슴 아프고, 외롭고, 어두웠다.
“쓸쓸해 보여.”
이곳은 쓸쓸한 곳이니까.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대로,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대로 가슴 아플 것이다. ‘금방 또 만날 거야’라는 기약 없는 소리는 공허하게 공중에 흩어지겠지.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다시 돌아갈까?”
“응. 같이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
이번에는 그녀에게 어깨를 빌려주며 생각했다. ‘시험은 어떻게든 되겠지.’
물론 시험은 어떻게든 되지 않았고, 나와 그녀는 재시험을 봐야 했다. 가끔 기침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감기에 걸리면 그때가 생각난다. 감기에 취해 공중을 걷듯, 소유스 안을 이동하듯, 꿈을 꾸듯 다녀왔던 공항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