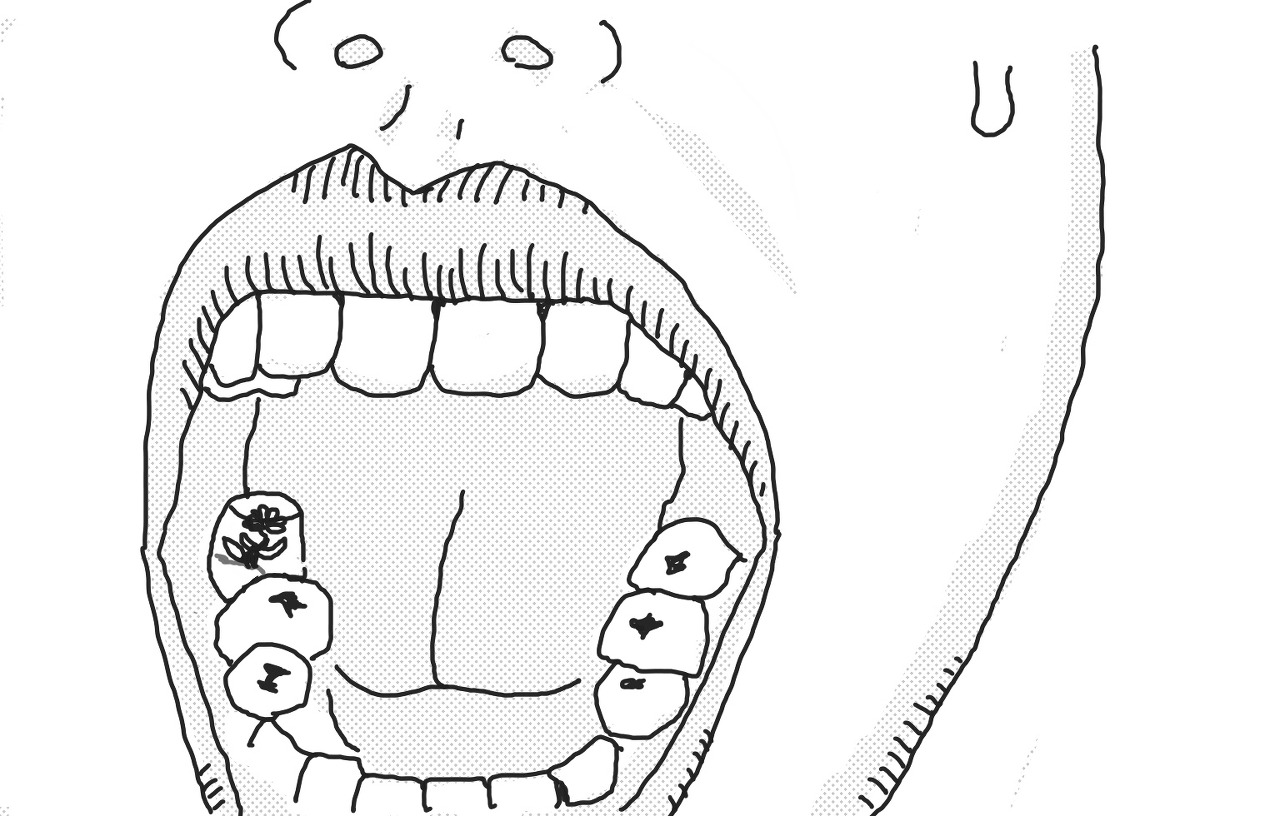난 빛이 좋아요. 어쩌면, 그림자를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카메라 메커니즘에 그다지 깊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어깨 내려앉을 정도로 거대한 렌즈와 카메라를 싸들고 다닐만한 정성도 없죠. 그런 내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끔 예쁜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 순간을 캡처한 디오라마를 유리상자에 담 듯, 마지막 붓질을 끝낸 유화에 픽사티브를 뿌리 듯 – 그 장면을 그대로 손바닥만 한 스퀘어에 담아두고 싶기 때문이라고요. 나중에 그때가 생각날 때 그 순간 그대로를 눈앞에 마주할 수 있도록…’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렸을 때 숲에서 빛과 그림자 사이 수십수백의 극명한 그라데이션과 색의 배리에이션에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는 나뭇잎들도 부서지는 햇살 아래 옅은 녹색, 짙은 녹색, 투명한 녹색. 그리고, 그림자 아래 흑녹색까지 색의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을 수많은 녹색들로 어우러져 서로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빛이 좋았던 건지, 그림자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그 둘 사이의 극적인 대비와 강렬한 변화가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후로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을 만나면 늘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찰칵’ 담아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 혹은 카메라에 그 장면을.’
….
..
.
‘……..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카메라를 왜 훔쳤냐고!!!!!’
경찰은 휴양지에서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넘긴 카메라를 들고 튄 절도범을 향해 짜증섞인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