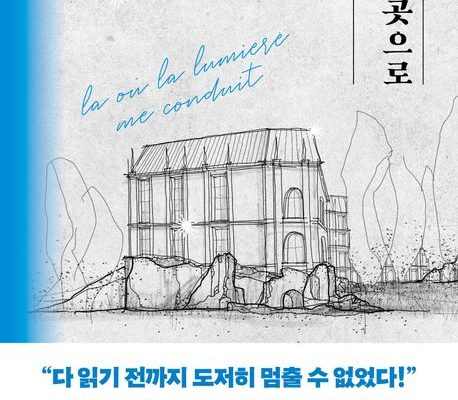친구의 SNS 담벼락에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 감상을 보게 되었다. 연예전문기자인 친구는 이 영화가 좋았다고 했다.
나는 이전에 이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꽤 오래전에 읽었던 ‘드라이브 마이카’는 하루키의 소설 ‘여자 없는 남자들’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단편이었다.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 개연성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어색했던 기억이 난다. 가후쿠(주인공, 배우)가 미사키(조연, 운전사)에게 와이프와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건네는 부분이 그랬다. 하지만, 단편의 특성상 빠른 전개가 필요했을 테니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도 있다.(어쩌면 일본 문화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 외에는 – 다른 그의 단편들처럼 –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았다. 그런 이유로,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감상했다.
물론 단편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호흡을 늘이고, 서사를 더하고, 없던 설정이나 사건들을 덧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작업 속에서 단편이 가졌던 단단한 무언가는 물러지고,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희미해지고, 이야기는 지루해진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카’는 과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진 이야기들이나 서사들이 덤덤하고 평화로운 영상 위로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계속 튀어 올랐다. 그리고, 그게 너무 불편했다. 마지막 씬에서 상실을 딛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 이건 하루키가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도 완전히 결이 다르다 – 그 주제가 과연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감독이 하루키에게 각본을 보여줬을 때 괜찮다고 했다지만,
분명히 괜찮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아까웠던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