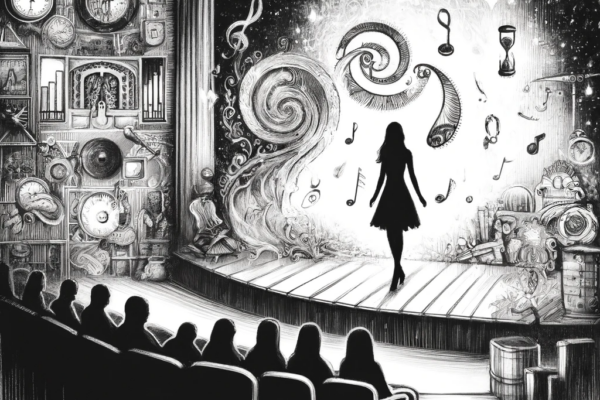오래전 파리에 갔을 때였다.
루브르 박물관의 수많은 사람에 지쳐서 무작정 바깥으로 나와 어스름해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꺄후셀 다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때는 그 다리가 꺄후셀 다리 인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 위에서 센강 쪽을 한참 바라봤었다. 양쪽 강가에 꽤 많은 사람이 삼삼오오 몰려 앉아 강 쪽을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게 꽤 좋아 보였다. 소리를 지르면 강 건너편 사람이 돌아볼 정도로 좁은 강폭 덕에 강변의 가로등 불빛만으로 강 전체가 반짝거렸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이 좋아 살짝 눈을 감으니, 사람들 북적이는 소리 사이로 오색 빛들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옆으로 젤다나 스콧 피츠제럴드가 지나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그 낡은 도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 주변은 그대로 고흐의 그림이었다.
서울도 예쁜 곳이 참 많지만, 나는 늘 한강이 불만이었다. 멋대가리 없이 큰 강은 아기자기한 맛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까. 어느 다리를 골라도 걸어 건너려면 족히 20분은 앞만 보고 걸어야 하며, 자전거를 타도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 10분은 너끈히 걸린다. 강 옆의 팔 차선 고속도로 덕에 도시와 강은 남과 북처럼 멀기만 했고, 건물의 예쁜 불빛은 강 바깥쪽 둔치에 흩어져 버렸다. 그런 이유로 한강 밑으로 내려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다.
‘우리는 대신 올림픽 공원이 있잖아.’
라고 해봤자, 파리에는 450개가 넘는 공원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에펠탑 앞 트로카데로 광장의 분수는 연인과 직접 올라가 앉을 수도 있다. 물론 남자끼리 앉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장난치다가 떠밀려 추락이나 할 테니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다.(제법 높음)
하지만, 운동으로 한강을 걷게 되면서 ‘이게 생각과는 아주 다르구나.’ 하게 되었다. 도시 곳곳에 숨겨진 한강 시민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건너편에는 북적북적한 도시와는 유리된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 인구가 다 들어와 앉아도 강으로 밀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넓은 한강 공원은 나름대로 운치가 있다. 옆 사람이 들을 걱정 안 하고 친구와 진지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조금 걷다가 강을 바라보면서 간단하게 맥주도 한잔할 수 있다. 내키면 자전거를 타고 내 달려도 될 만큼 한강은 넓은 가슴으로 많은 사람을 여유롭게 끌어안는다.
문명이 강을 끼고 발전했다는 건 분명히 우연은 아니다. 물론 물도 마셔야 했을 테고, 씻기도 해야 하며, 농공업 용수도 꼭 필요했겠지만,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보며 그 옆을 걸을 수 있는 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큰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그래. 열심히 살아야겠어!
하며 증기기관, 비행기, 아이폰을 만들어 냈다. 물론 그렇게 결심하고는 길가의 자전거를 훔쳤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고, 오늘 날씨도 좋으니 한번 한강으로 나가볼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