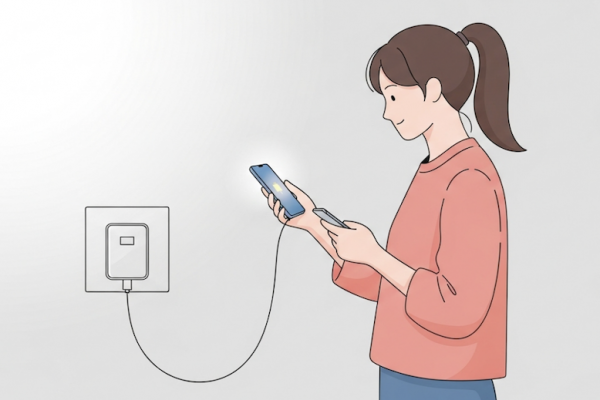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동네 골목에 숨어있는 예쁜 카페를 발견했다. 무엇보다도 간판이 없는 게 마음에 들었다. 언뜻 보면 꽃집 같기도 해서 옆을 지날 때 고개를 돌려 자세히 들여다 본 사람만이 그 카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 날 카페에 앉아 바깥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앞만 보고 걸어 아쉬웠다. 저들은 매번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다는 걸 아직 모를지도 모른다. 하긴 그래봤자 나도 평일에는 늘 그렇게 걸어 다니니까. 사람 사는 게 별 다를 바 없다.
– 쿠폰 찍어드릴까요?
두 번째 갔을 때 주문을 받던 점원이 갑자기 물어왔다. 나는 쿠폰을 제대로 모을 만큼 성실한 사람은 아니지만, 갑자기 받은 질문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 지난 주말에도 오셨었죠? 두 개 찍어드릴게요!
이때 ‘점원이 아니고 오너구나’ 했다. 아무리 주체적인 점원이라도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는 건 부담스러울테니 말이다. 그녀는 스탬프 패드를 열어 쿠폰 도장에 잉크를 묻혔다. 그리고는 쿠폰지에 도장을 꾹-꾹- 두 번 눌러 찍은 후 내게 건네주며
– 여덟 번 더 찍으시면 한 잔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하고는 미소지었다. 고마웠다.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꽤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는데, 혼자 운영하는 카페라 조금만 손님이 몰려도 상당히 바빠보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던가, ‘너무 늦어서 디저트도 조금 같이 드렸어요.’ 하며 사근사근하게 열심히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보며 이전에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카페를 열었던 동료가 이 년 만에 사업을 접으면서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 카페에 있으면 너무너무 심심해요.
너무 바쁜 것도 싫긴 한데, 너무 심심한 것도 참기 힘든 것인가 보다. 개인적으로 손님이 없으면 듣고 싶은 음악도 크게 듣고 책을 보기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영업시간이라는 건 업무시간 같아서 뭘 하고 있어도 빨리 지나버리는 것만 못할 지도 모른다.
그래도,
잠깐 햇빛 아래 앉아있을 수 있는 카페 앞 작은 나무의자도 정겹고,
바람이 불면 하늘하늘 잎이 흔들리는 아이비 화분도 귀엽고,
무엇보다도
커피가 맛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녀가 파이팅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