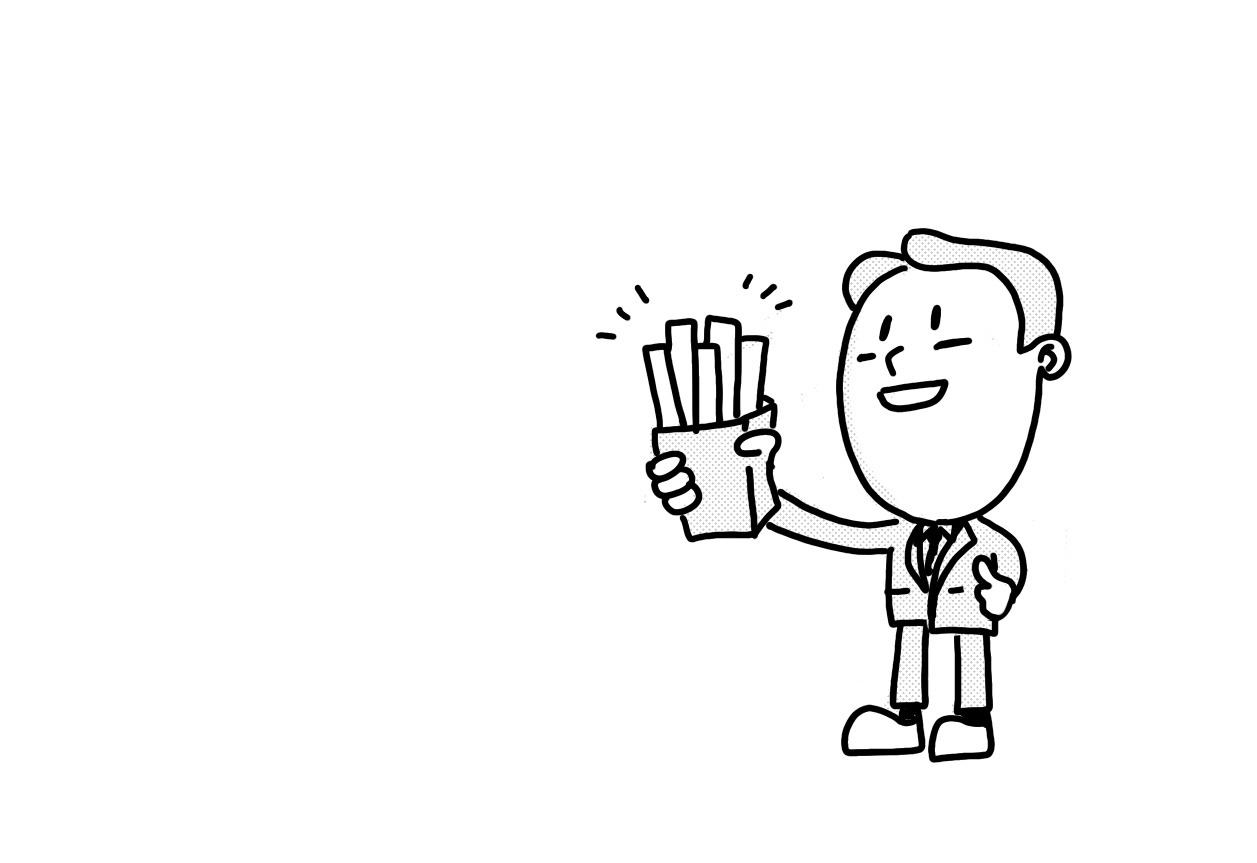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구가 와이프와 함께 서울에 놀러 왔다. 그는 나를 늘 ‘형님’이라고 불렀고, 기골이 장대한 그와 함께라면 텐더로인을 걷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늘 ‘핫핫핫’하고 웃는 갓 군대를 제대한 청년이었던 그는, 이후 결혼을 했고 지금 와이프는 임신 사 개월 차다.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놀러 온 그들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꽤 오랫동안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와이프가 내게 ‘Kurt, 일하면서 영어 많이 사용해? 그때보다 영어가 더 자연스러워.’라고 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는 그다지 영어를 쓸 일이 없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더 익숙해졌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하지만, 언어라는 게 지리과목 같은 암기형은 아니니까. 이미 내 안에 신 것을 보면 침이 흐르듯 그렇게 스며들어 버린 건지도 모른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요즘 친하게 지내는 미국인 친구에게 메신저로 ‘정말 오랜만에 미국에서 알던 친구를 만났는데 내 영어실력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래?’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금 후 그녀의 답이 도착했다.
Did you treat them di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