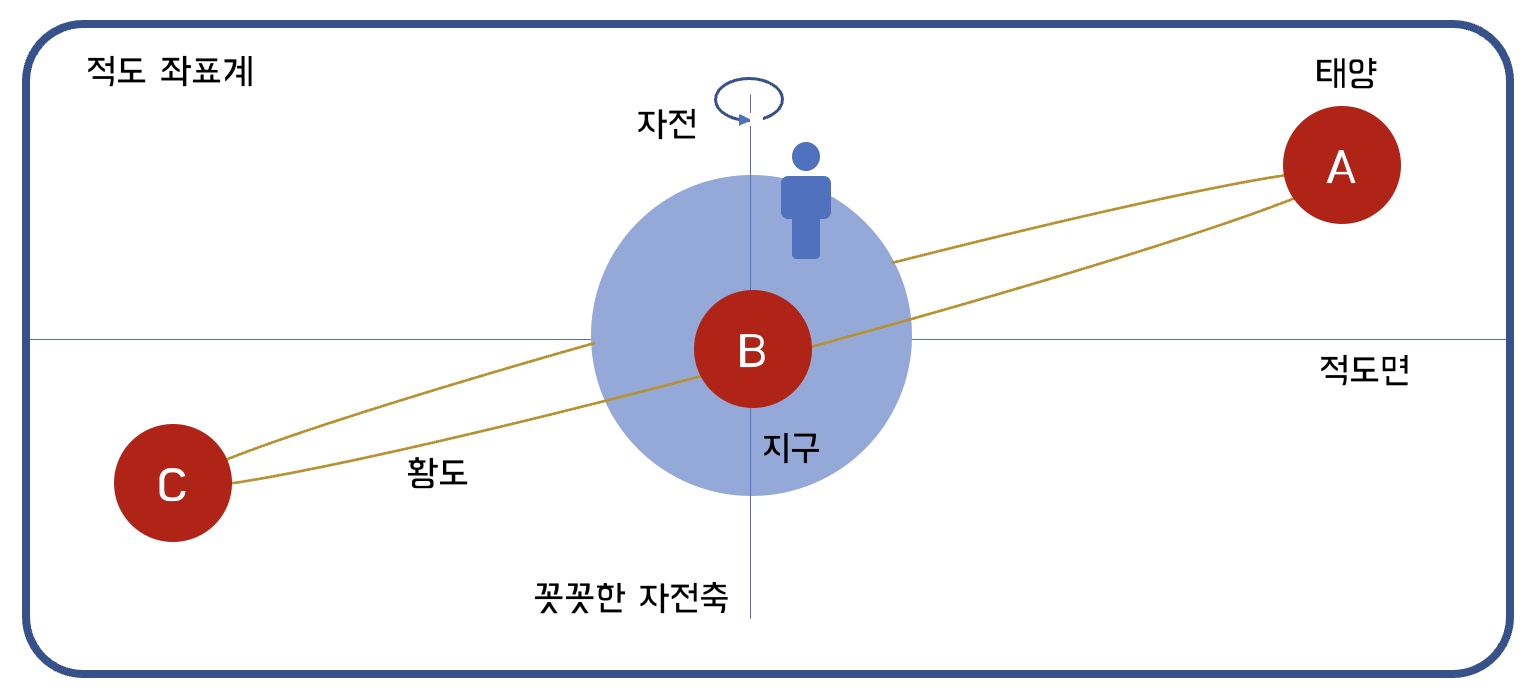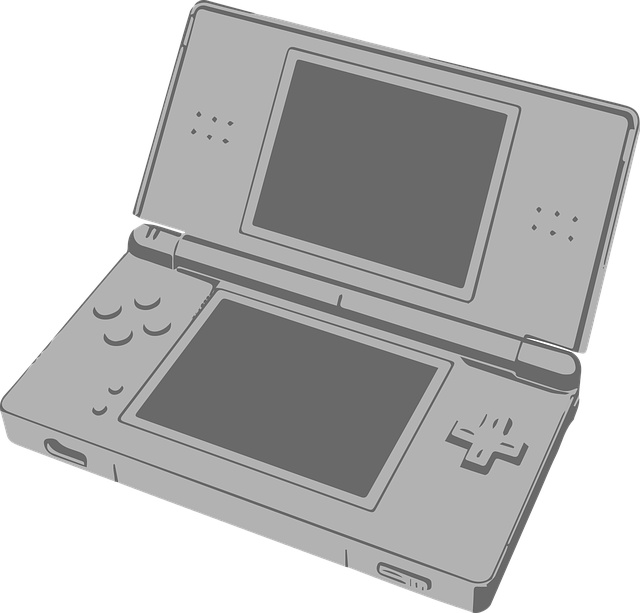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하기 전날까지도 그 장소를 몰랐다. 내게 이런 건 흔하다. 심지어는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장소라는 것을 직전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고치고 싶어서 꽤 노력을 해봤지만 허사虛事였다. 고치기 전에 이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적응해 버렸달까? 다행히 이번에는 전날 검색을 했는데, 그곳은 집에서 꽤 멀었다.
나무를 심는 장소는 ‘노을공원’이라 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 하지만, 이곳은 무려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장을 준비할 때 함께 만들어졌다고 한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몰랐다.(원래는 난지도라는 쓰레기 매립용 섬이었다고 함) 마포는 평소에 갈 일이 없는 곳이다. 아는 길도 제대로 못 찾는 나는 일찍 집을 나서서 장님 문고리 찾듯 ‘노을공원’으로 향했다. 모이는 장소를 찾아 공원 안을 꽤 오래 헤맸는데도 쓰레기 매립지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긴 쓰레기 매립 흔적이 보인다면 공원 조성이 실패한 것이겠지만…
봉사활동을 주최하는 분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나무를 심는 곳은 아직은 군데군데 옛 매립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 이유로 그 장소는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지 않으며, 엄청나게 두꺼운 철문으로 사람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분은 이곳도 언젠가는 일반인들에게 오픈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계속 나무를 심고 계신다고 했다. 주변 사람의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봉사를 하다니, 존경스러웠다. 바라는 미래도 딱히 없이 오늘만 사는 내겐 더 멋져 보인다.
‘나무를 심는다니 그게 무슨 봉사활동이야.’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땅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군대에 있을 때 땅을 몇 번 파보고는 바로 사무직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었다. 삽질 자체는 별게 아닌데, 돌 등의 방해로 예상했던 삽의 궤적이 저지될 때의 충격이 상당하다. 처음이라면 다음날 몸살로 꽤 고생을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힘들다.
공원은 인공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흙 아래쪽에 언덕이나 길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들이 많았다. 땅을 파다가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장소를 덮고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나무 두 그루를 심는다면 서너 군데를 파헤치는 것은 기본이다. 일단 깊이 땅을 팠으면, 나무를 심은 후 흙을 반쯤 덮어 발로 꼭꼭 눌러준다. 설명하는 분은 그때 살짝 나무를 들어 올려보고 딸려 올라오면 다시 깊게 심으라고 했다. 물론 아무도 들어 올려보지 않는다. 나도 안 했다. 이후 물을 흠뻑 주고, 다시 흙을 덮는다.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이 고일 수 있게 해 주면 작업 완료다. 친구와 함께 네 그루를 심고 나니 온몸이 뻐근했다. 그래도, 이렇게 몸을 써서 무언가를 하는 게 흔한 경험은 아니니까. 살짝 땀으로 젖은 몸이 옷틈 새 산들바람에 마르는 느낌도 그렇다. 어렸을 때 하루종일 뛰어놀다가 어둑어둑해져 집으로 돌아갈 때 저녁바람에 몸이 식는 그런 느낌. 그때도 꽤 뿌듯했었던 기억이 난다. 몸을 움직인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 몸이 식는 과정은 그것을 오롯이 느끼는 확인의 시간이기 때문일까?
노을공원에서 조금만 나가면 망원동이다. 누군가가 맛집을 검색하고, 일사불란하게 차를 나누어 탄 후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런 때가 되면 나는 진심으로 인간의 상호보완적 생존방식의 우수성에 감탄하게 된다. 나 혼자라면 아무것도 못 먹고 겨우 집에 도착한 것에 만족했겠지. 고마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밖에 나오니 해가 머리 꼭대기에 서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헤어졌고, 나는 천천히 주변을 걸으며 망원동을 구경했다. 언제 또 이곳에 올 지 모르니까. 이곳에 사는 친구가 불러서 술 한잔 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기억이 문득 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정신 차려. 거긴 문래동이야
왜 우리나라는 동네 이름이 모두 비슷비슷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