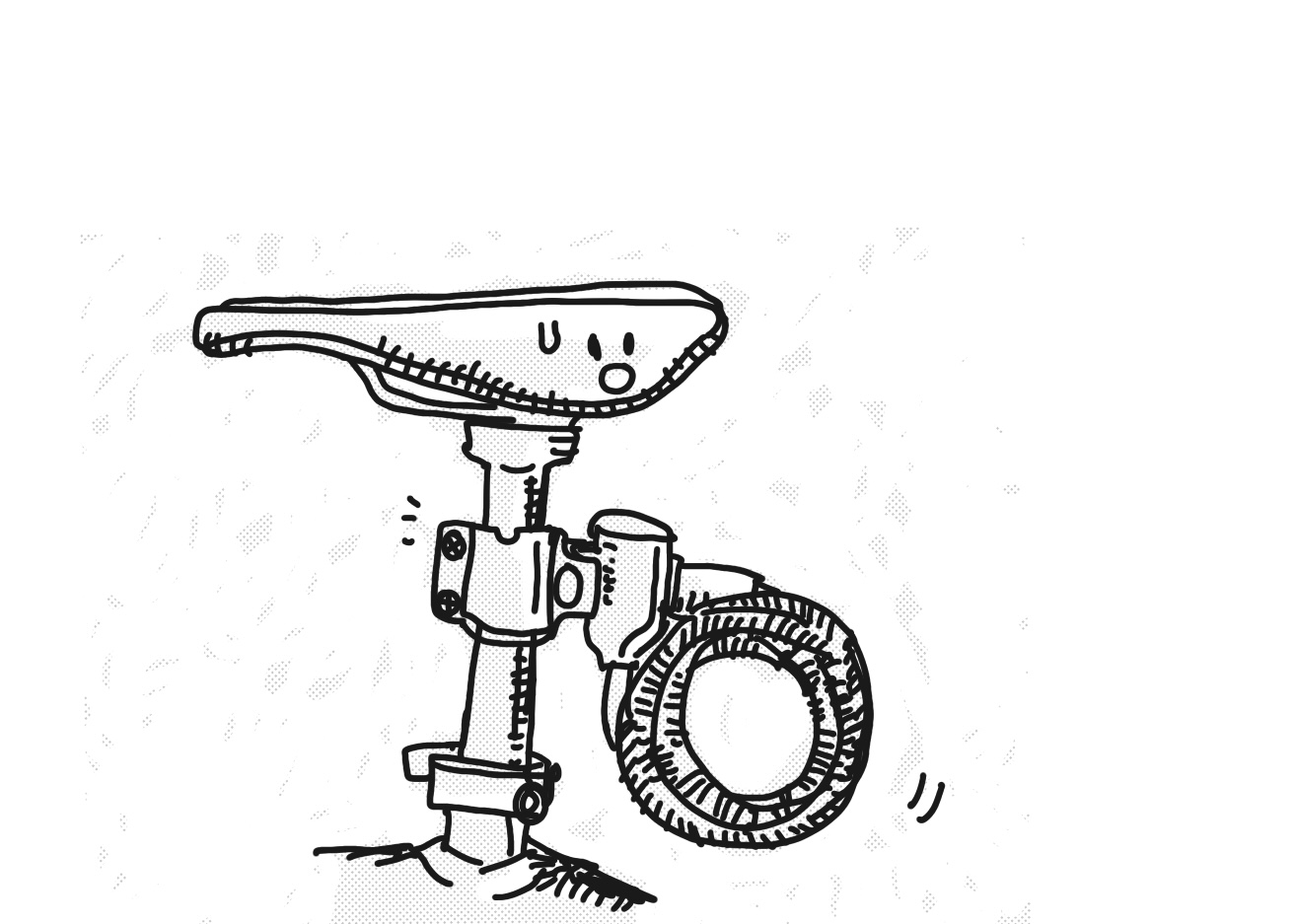그곳의 밤은 이곳의 새벽. 그리고, 또 다른 곳의 오후
어렸을 때 기계적으로 교과서를 통해 암기로 학습된 시차는,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 해도 생활 속에서는 늘 낯설기만 했다.
토머스 스태퍼드와 유진 서넌이 달 상공에서 달 표면을 내려다보고 온 지도 40년이 훨씬 넘었지만, 실제 살아간다는 건 그런 별세계 이야기나 과학 논리의 바깥쪽에 유리되어 있으니까. 날짜 변경선을 경도 180도 지점에서 깔끔하게 내리긋지 못했던 것도 과학보다는 아나디리 지역 사람들의 생활이 중요했기 때문일 거다.
몇 년 전 겨울, 날짜변경선을 지나 호주로 가면서 크리스마스이브를 잃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가 23일, 시드니에 도착한 날이 25일이었으니, 나의 2015년에는 크리스마스이브가 – 바빌로니아의 바벨탑처럼 –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건 왠지 억울하게 느껴진다.
‘크리스마스이브 같은 건 한 번쯤은 없어도 괜찮잖아?’
라고는 누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테니까. 여자 친구나 우산과는 다르게, 크리스마스이브가 사라지는 것은 좀처럼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뤼브롱 산에서 하루 종일 양을 치는 목동이 시간을 한 시간 앞으로 당겨 맞출 일도 없고, 베네치아의 고리대금업자가 그해 마지막 날을 건너뛰어 새해를 맞이할 일도 없다. 적어도 지구의 자전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꽤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이유로 시차나 날짜 변경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 덕에 이동할 때마다 시차에 대한 배려를 하는게 귀찮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대가 되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생긴다.
살아간다는 건 복잡하지만, 그래도 잃고 얻는 것이 늘 평형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