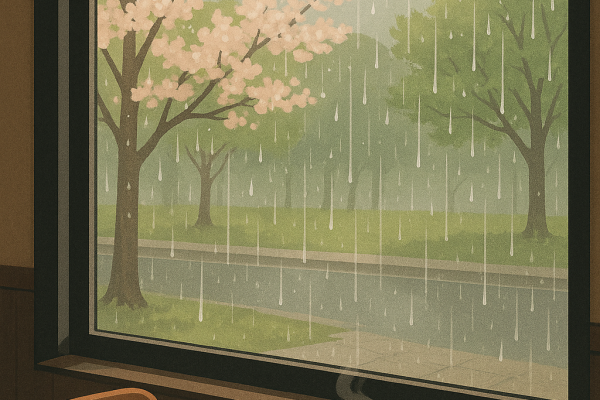어제 하루 종일 바깥에 있었더니 꽤 피곤했나 보다. 일어나 아침을 먹은 후 꽤 오랫동안 첫 번째 챕터를 넘기지 못했던 책을 들었지만 얼마 못 버티고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쇼팽의 녹턴은 그대로 꿈의 배경 음악이 되어버렸고, 나는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듯 새벽의 꿈을 이어갔다. 다시 일어나 보니 오후 한 시. 프란츠 리스트의 Love Dream이 주변 공간에 가득 차 있다. 아마 이 곡의 중반부 크레셴도 몰토로 타건하는 클라이맥스에서 잠을 깼을 것이다. 지금은 피아니시모로 페이드 아웃되며 안 그랬던 척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잠든 것이 오전 아홉 시쯤이었으니 정말 푹 자버리고 말았다. 천천히 일어나 건조기에 넣어두었던 이불 커버를 빼내어 거실 창문 옆 소파에 넓게 펼쳐 걸어 둔다. 건조기가 빨랫감의 건조시간을 어떤 로직으로 계산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조된 빨랫감들은 아직 – 설거지 후 건조대에서 마지막 물기를 바람에 날려버리기 전 주방용품들처럼 – 살짝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저. 아직은 조금 더 햇빛 아래 앉아있고 싶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탈수가 끝난 다른 빨래도 섬유 유연제와 함께 건조기에 밀어 넣고 한번 더 시작 버튼을 누른다. 건조기는 언제나처럼 무책임하게 대충 시간을 세팅하고는 웅웅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정도의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대충 주말 오후가 되어 있다. 가끔 세탁으로 시작하지 않는 일요일도 있는데, 이 때는 언제부터가 오후인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것을 보면 습관이 참 무섭다.
‘오늘은 정말 집에만 있어야지’ 하며 커피를 내리는 동안, 라디오는 한 곡의 중복도 없이 성실하게 다음 곡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창을 열면 기분 좋은 바람이 흘러 들어오는 여름의 초입이다. 창 앞에 앉아 미지근한 바람을 맞으며 올여름도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