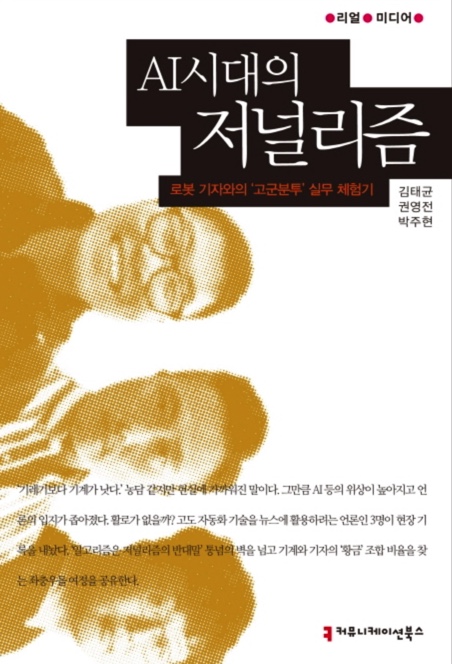이 글에는 영화 ‘미나리’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 창문을 여니 오랜만에 선선한 바람이 밀려들어 온다. 나는 에어컨을 끄고는 바람을 마주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는 봐야지 하면서 서너 달이 훅 지나버린 미나리를 걸었다.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본다.’ 이건 진심으로 더할 나위 없는 어른의 오후다. 술과 아카데미 시상작이라니, 아이들은 생각도 못할 조합이니 말이다.(적어도 미성년자는 술은 안 되니까)
스티브 연과 한예리가 넓은 들판에 놓여있는 바퀴 달린 집 앞에 서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극 중 무대는 아칸소 주지만, 실제 촬영은 오클라호마에서 했다고 한다. 스토리는 잔잔하게 진행되지만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다.
스티브 연은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발음은 꽤 좋았다. 내 일본어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칭찬인지 아닌지 헛갈렸던 기억이 난다. 스티브 연의 한국말은 칭찬해줄 정도도, 그렇다고 비난할 정도도 아닌 딱 그 정도였다. 내 일본어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 대 김(미국 드라마 로트의 권진수 역)정도의 한국어 실력이었다면 이 영화는 성공하기 힘들었을 지도 모른다.
이 영화는 있을 법한 이야기다. 사실 모든 영화는 있을 법한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모든 영화들 사이에서 가장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덕에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를 즐길 수 없고, 상대적 비교로 현재에 만족할 수 없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재에 머물 수 없다.
주인공인 제이콥(스티븐 연 역)도 모니카(한예리 역)도 모두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으며, 그런 본질에 의한 동질감과 방식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이야기 지탱하는 큰 줄기가 된다.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본질을 내재한 갈등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관객은 극히 평범한 사건인 아이 상태의 호전에 쾌재快哉를 부르고, 그가 처음으로 뛰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 영화는 사실 진행이 조금 애매하다. 극적인 전개를 위해 헛간에 불을 지른 것이 오히려 중후반까지 끌고 왔던 ‘있을 법한 이야기 작전’을 실패로 만든 것은 아닐까? 모든 희망을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듯한 그 장면 이후 그들의 삶이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비약적으로 평범해져 버리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아쉬웠다. 헛간이 그대로이고, 그와 그녀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고, 다음 주부터 야채는 납품이 되고, 할머니의 뇌졸중은 심해지는 심심한 전개라도 괜찮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영화도 필요하다. 물론 감독은 헛간의 불로 그와 그녀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겠지만, 덕분에 관객은 스토리의 몸통이 후둑 뜯겨나간 듯한 결말을 건네받고 말았다.
상 받은 영화가 재미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클리셰지만, 그래도 늘 그런 영화들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건 ‘받을 이유는 다 있구나’하는 것이었다. ‘미나리’도 그랬다. 특색 없어 보이면서도 내 가슴을 꾸욱 누르고 갔던 영화, ‘미나리’를 추천해본다.
(쿠팡 플레이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광고가 아니라 정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