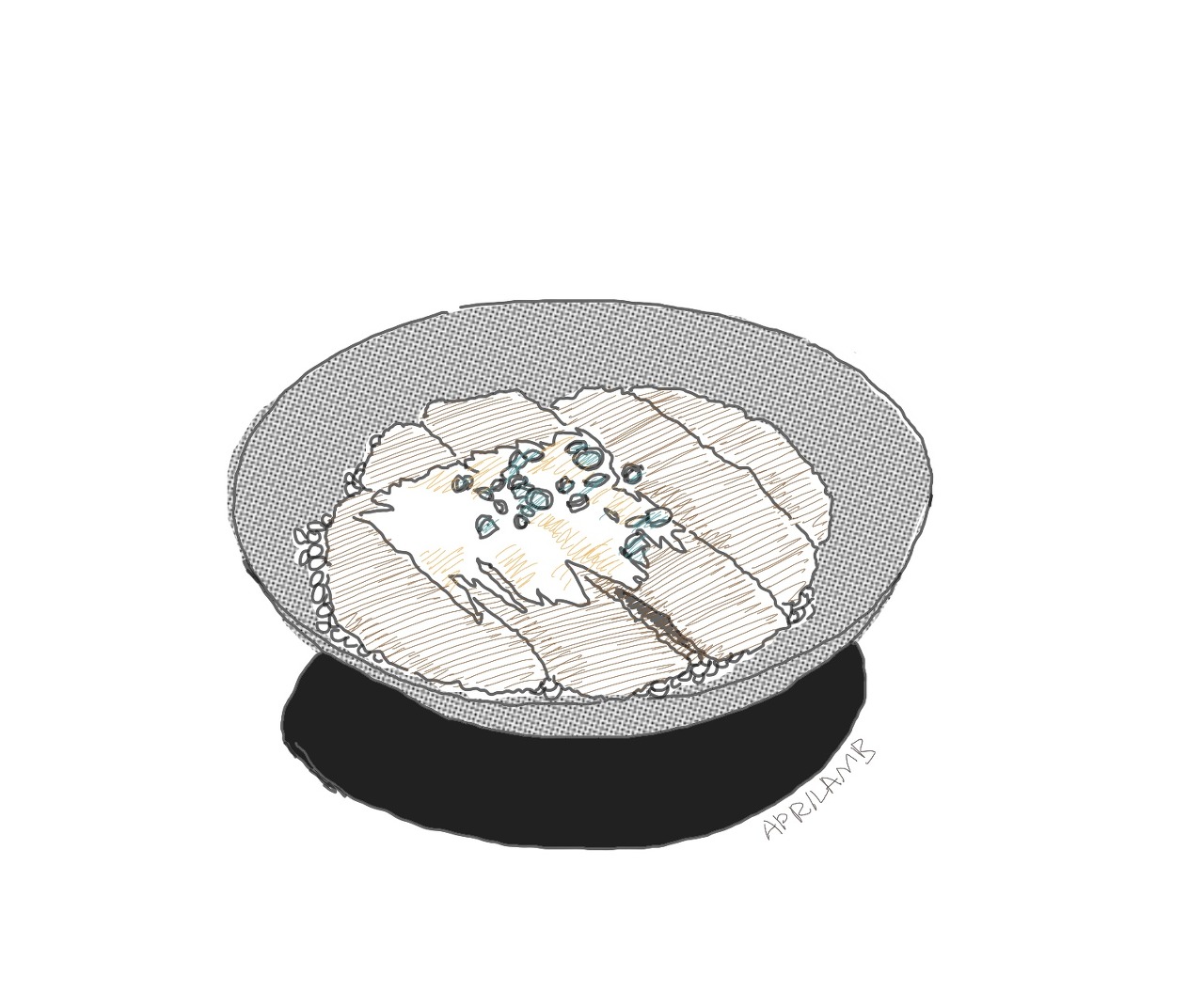미국에 살 때, 방학기간 동안 배낭 하나를 메고 유럽을 돌았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를 보러 토론토로 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런던으로 이동했었다. 런던에서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로 갔다가 다시 항공편으로 베를린에 들어간 게 집을 떠난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고, 그 여행의 중반 즈음에서 나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빌어먹을 유럽의 여름은 너무나 더웠다. 게다가 나는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다. 내 사전 준비는 국가별 이동수단 예약과 숙소뿐이었고, 여행지별 계획 따위는 애초에 준비도 안 했었다. 다행히 독일에는 오래된 친구가 살고 있었고, 나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아 적을 수 있지?”
그녀는 내게 버스 노선을 하나 받아 적으라고 했다.
“내일 아침 호텔 옆에서 이 버스를 타. 버스 안에서 잠들지 말고 창밖을 보다가 밖에 뭔가 괜찮은 게 보이면 내려. 그리고, 그걸 다 구경한 다음에 다시 버스에 오르는 거야.”
그 버스는 베를린을 가로질러 유명한 스폿을 모두 지나간다고 했다.
“그렇게 낮에 여행을 하고, 저녁에 나랑 같이 축구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거야.”
축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계획은 멋지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검색하며 동선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아침에 호텔을 나서는데, 날씨가 무척 더웠다.
조금 늦게 나와서 그런지 호텔 주변은 무척 한가했다. 물론 원래 한가한 지역일 수도 있다. 친구가 일러준 대로 호텔 옆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한 십오 분 남짓 기다렸을까? 호텔 뒤편에서 버스 하나가 굼벵이 같은 속도로 다가왔다. 버스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 뒤쪽 자리에 앉아 천천히 움직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친구는 뭔가 괜찮은 게 보이면 내리라고 했다. 조금 가다 보니 꽤 커다란 흰 건물이 보였고, 나는 무작정 하차벨을 눌렀다.
유적지나 박물관이었으면 좋았겠지만, 하필이면 슈프레 강 옆의 그 건물은 국가 의회 의사당이라고 했다. 나는 서울에서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본 적이 없다. 크게 실망하고 다시 정류장 쪽으로 걷는데, 길 맞은편에 큰 공원이 보인다. 나는 천천히 그 공원 안쪽으로 들어갔다. 시간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것이다.
공원 바깥쪽은 관광객들이 꽤 있었지만, 안쪽의 소비에트 전쟁 기념관 동상 근처는 심해처럼 고요했다. 몇몇 사람들은 물감에서 막 짜낸 것 같은 녹색 잔디 위에 누워 쉬고 있었고, 나도 그들이 있는 잔디밭 근처로 살짝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어렸을 때부터 ‘잔디를 보호하자’는 팻말에 익숙해진 나는 잔디를 밟을 때마다 죄지은 기분이 된다.
앉아 바닥에 손을 대니 아직 어스름하게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잔디들이 차갑게 만져진다. 손으로 살짝 쓸면 마치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는 것 같다. 아 이런 좋은 기분이구나 잔디에 앉는다는 건 말이야. 남들처럼 누워볼까 하고 자리를 보다 보니 주변에 잔디와 함께 클로버 잎들도 한가득이다.
대학교 때 엠티를 가서였을 거다. 엠티 촌 옆 잔디밭을 걷고 있는데 한 후배가 클로버 잎이 잔뜩 있는 것을 보고는 웅크리고 앉더니 금세 네 잎 클로버를 찾아냈다. 실제로 네 잎 클로버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후배는 내게 네 잎 클로버를 건넸고, 나는 며칠 후에 영장을 받았다. 나름 군대에서 즐거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불행의 전조였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네 잎 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주지 않은 건 확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다.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런 이유로 네 잎 클로버를 찾기 시작했다.
클로버라면 정말 시골 밤하늘의 별처럼 많았어서 조금만 뒤적거리면 서너 개는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이십 분이 넘게 살펴봤지만 하나도 못 찾고 말았다. 덕분에 군대에 다시 갈 일은 없었겠지만, 꽤 실망하고 말았다. 마침 들고 갔던 책도 있어서 찾았다면 꽤 멋지게 말릴 수 있었을 텐데…
천천히 공원을 걸어 나와 근처의 흔한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흔한 딸기 프라푸치노를 주문했다. 네 잎 클로버를 찾았다면 꽤 멋진 로컬 카페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달달한 프라푸치노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그 프라푸치노 한 모금으로 기분이 거짓말처럼 좋아졌다. 네 잎 클로버는 아무래도 좋았다.
살아간다는 건 프라푸치노로 네 잎 클로버가 잊히는 것과 닮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