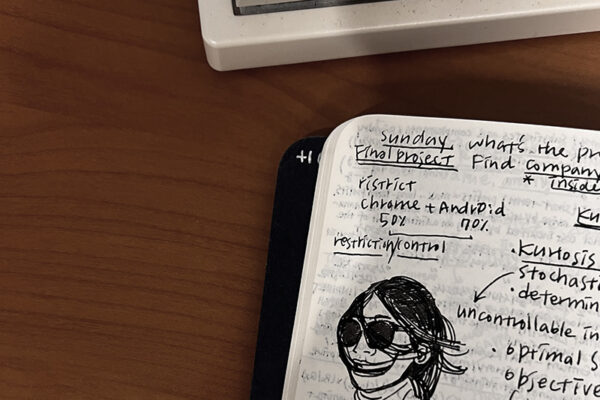어제 아침부터 갑자기 스위치를 내리듯,
‘딸깍~’
겨울이 왔다.
일이 있어 운동도 할 겸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갔는데, 친구가 교대에 괜찮은 카페가 생겼다고 했던 게 기억났다. 교대면 자전거로 십오 분 정도의 거리다. 공미학이라는 그 카페는 일층의 작은 테라스와 루프탑이 참 예뻤는데, 친구는 빵이 맛있는 곳이라 했다. 나는 그곳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다가 집으로 향했다.
카페 바깥은 한낮이었는데도 한기가 새벽의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집에 가는 도중에 손이 시려서 몇 번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낯설었다. 아무리 손이 시려도 장갑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내 기억 속의 계절은 아직 ‘가을’이었기 때문이다.
저녁 뉴스에서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점퍼를 하나 더 입었는데도 여전히 추웠다.
2015년 내겐 크리스마스이브가 없었다. 나는 12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행 비행기를 탔고, 날짜변경선은 내게 그해 크리스마스이브를 빼앗아갔다. 덕분에 2015년만큼은 크리스마스이브의 트리 점등식도, 달링하버의 불꽃놀이도 내겐 허락되지 않았다.
올해의 가을도 그때의 크리스마스이브처럼 빼앗겨버린 기분인데, 제발 며칠 후 ‘뭔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하는 변명과 함께 한강 변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날씨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