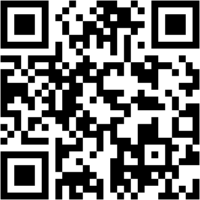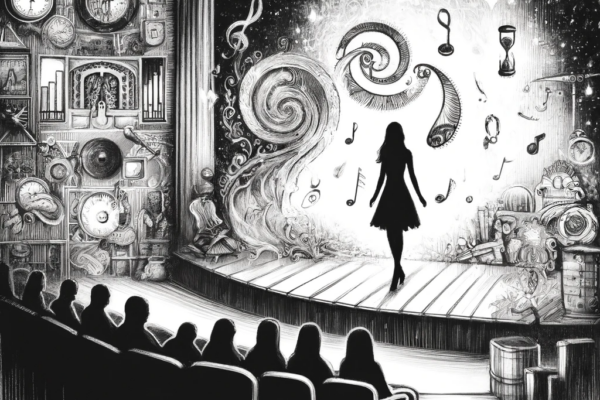연휴로 며칠 동안 집 안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집을 나섰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유리알 같이 차가운 바람이 폐 속으로 밀려들어 온다.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계절을 돌아 돌아 겨울을 다시 맞이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오랜만이네.”
하고 중얼거렸다. 겨울의 시린 바람을 마주하면 내 몸의 기관이나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게 된달까? 땡볕 아래 몸이 늘어지는 계절만 계속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겠지.
늘 춥다고 투덜거리며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겨울이라면 또 서운할 것만 같다. 왜 겨울이 겨울 같지 않냐며 삐죽거릴지도 모른다. 사람이라는 건 정말 변덕스럽다니까. 하지만 미워할 수 없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