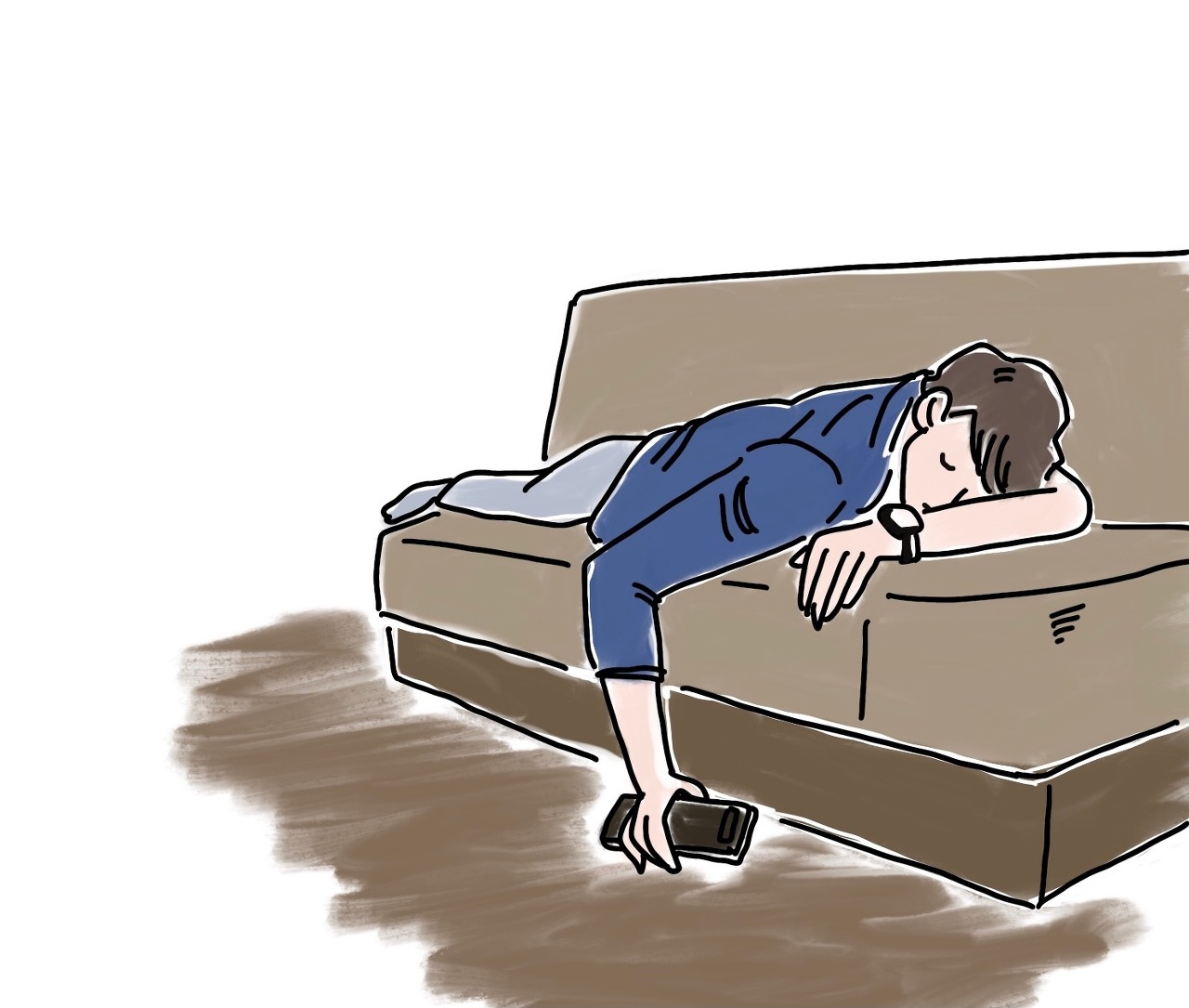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주문진으로 워크숍을 갔었다. 떠나는 당일까지 프로젝트에 정신없었어서, 다들 차에 올라타 건물 주차장을 나설 때 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나도 그랬다. 시간이 꽤 지나 양양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멀미를 하고 있자니 그제야 ‘먼 곳에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관령에 터널이 생긴 이후로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힘껏 밟으면 두 시간이 안 걸린다. 어렸을 적 멀미가 심했던 내게 굽이굽이 기어올라가야 했던 아흔아홉 굽이 대관령 고개는 인생 최초의 난관이었다. 그 길에 진입할 때면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의 승무원처럼 뒷좌석에서 두 눈을 질끈 감고 관성의 법칙에 몸을 맡긴 채 해상 귀환의 순간만을 기다렸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지도 모르게 오르다 보면 누구나 잠시 쉬어가게 되는 대관령휴게소에 도착하게 된다.
그곳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열면 사계절 어느 때라도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어왔다. 아직 꿈꾸는 듯한 상태에서 바람소리에 이끌려 휘적휘적 걸어 나와 마주했던 강릉과 동해바다의 절경은, 요즘도 눈을 감으면 가끔 어제처럼 떠오를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웠던 멀미나 황홀했던 풍치風致는 터널과 함께 인생 뒤쪽으로 잠겨버렸다. 사는 건 그런 일들의 연속이다.
오후 일곱 시 남짓 도착한 주문진은 벌써 주변이 칠흑 같아서, 지척의 숙소를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짐을 대충 내려놓고 먼저 도착했던 친구들이 봐 두었다는 대게집으로 천천히 수다를 떨며 걸었다. 어둑어둑한 낡은 길을 걸어 주문진항 쪽으로 가다 보니 건어물을 파는 가게들이 보인다.
‘저기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을 보니 대게집이 있고, 그 옆에 바다가 함께 보였다.
‘바다를 마지막으로 언제 봤더라?’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대관령을 넘었을 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다는 앞으로도 꽤 보게 되겠지만, 대관령은 아마 죽을 때까지 다시 보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마치 오래된 여자 친구처럼.
‘저 건너편에 ‘도깨비(드라마)’에서 나왔던 등대도 있어. 지금은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내일 아침에 저기도 가보자고.’
회사만 아니면 ‘도깨비’에 나온 등대가 아니라 도깨비가 나오는 등대라도 좋았다. 우리는 배 터지게 게를 먹고, 숙소로 돌아가서 새벽 네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제 이야기했던 등대 앞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바다 쪽으로 열려있는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누구에게 건네는지도 모르게 ‘따뜻한 걸 보면 아직 겨울은 아니야. 그치?’ 하고 중얼거렸다.
‘카페 안이라서 따뜻한 거야.’
누군가가 대답했고, 나는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맘때쯤은 확실히 겨울이긴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