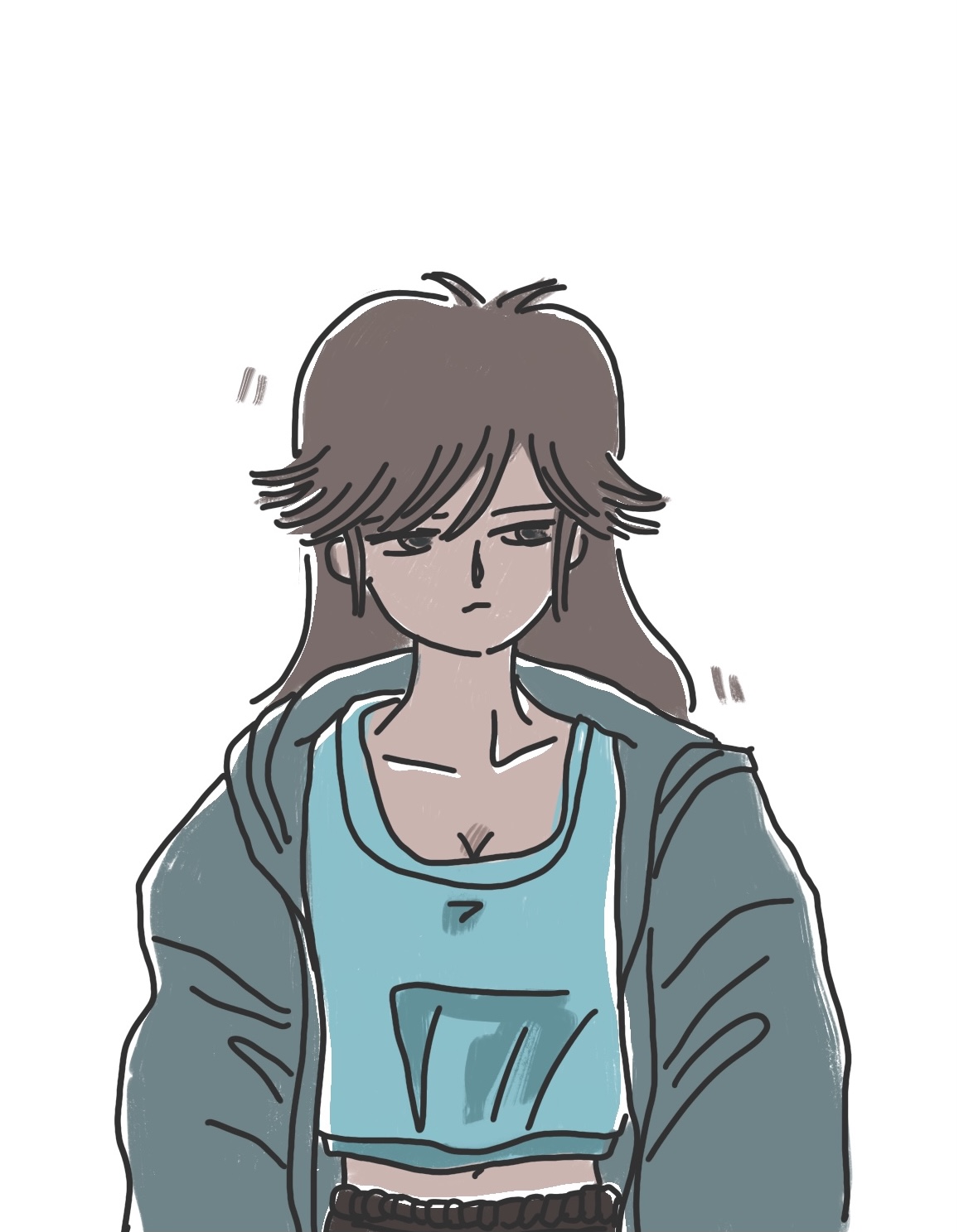얼마 전 봉사활동을 갔다. 타이틀은 ‘어린이 경제교실’로 보드게임을 통해 아이들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번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꼬맹이들로 여자 아이들 2개 조, 남자아이들 3개 조 총 30명가량이 옹기종기 강의실에 모여 있었다.
평생 아이들은 영화나 페이스북 속의 정제되고 똘똘하며 귀여운 모습들만 보아왔기 때문에 말 수 적은 수줍은 영혼들이 가득 모여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도착하니 가장 먼저 와있던 남자 학생이 필통에서 커터를 꺼내 위험하게 흔들어 대고 있고, 아이들은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악을 써대기 시작한다. 그 정도가 부족한 것 하나없는 사이코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씬이다.
대충 교육이 끝나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드디어 보드게임이 시작된다. 나는 그 게임을 리드하면서 은행 역할까지 수행해 내야 하기 때문에 무척 긴장한 상태. 그런데,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심술이 가득해. ‘애들아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줘.’라고 속으로 이야기해 보지만 독심술을 알리 없는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표독스럽다.
그래도 아이들은 어른보다는 착할테니 게임을 시작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주사위를 벽에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꼬마 1.
내가 제일 멀리 던질 거야!
아니 왜? 이해가 안가네. 내 옆에 앉은 일진 같은 여자아이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니, 자기가 뽑은 이벤트 카드에 앞 꼬맹이가 이득을 보자 짜증이 났는지 사물함에서 짐을 꺼내 나가버린다. 그 옆의 아이는 – 누가 나가던 말던 – 게임 룰이 공정하지 않다며 다른 팀이 던져야 하는 주사위를 꼭쥐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안되지. 자 이리 줘.”
하면서 그 애 손에서 주사위를 가져오려 하자 왜 손을 잡냐고 신고하겠다고 한다. 하하. 나도 잡고 싶지 않다고!
게임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고 한 팀이 너무 앞서 나가자 집중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아이들. 은행에 10만 원을 저금하겠다고 들이밀고는 30만 원이라고 적질 않나, 3칸 가야 하는데 4칸 슬쩍 가고는 주사위가 그렇게 나왔다며 막무가내로 버티질 않나, 그 와중에 은행을 터는 노랑머리 꼬맹이를 보면서 진짜 옆구리에 니킥을 날리고 싶었다. 이마에는 땀이 비 오듯 하고, 몸은 이미 오후 여섯 시 정도의 컨디션이 되어버린다. 그때, 전체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끝난건가?
세 바퀴만 돌고 그만할게요!
싫다고! 한 바퀴도 쓰러질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부처가 된 기분으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을 견뎌내면 세상에 못 견딜 것이 뭐가 있겠어. 기운 내자고…’
세 바퀴만 견디면 된다고 다짐하자마자, 다음 차례 꼬마는 주사위를 강당 앞 칠판으로 던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