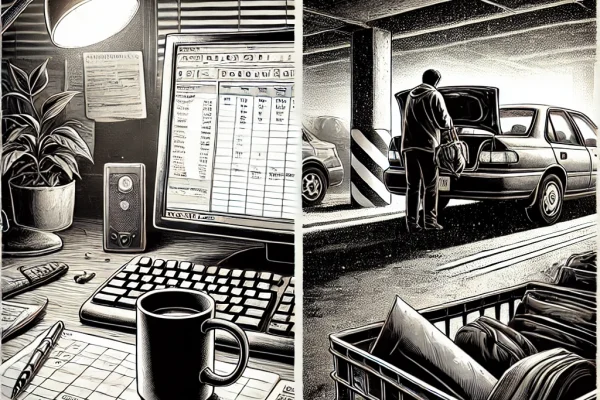‘손님,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나는 보통 주문하는 음료의 종류를 물어보기도 전에 아메리카노를 주문한다. 카페를 찾는 이유는 보통 전원을 빌려 랩탑을 쓰거나 책을 보기 위해서고, 음료 주문은 적합한 장소로 진입하기 위한 발권 절차 같은 거니까. 티켓이 총천연색이던, 흑백이던, 플라스틱 카드이던, 천공용 골판지이던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진입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된다. 게다가 나는 커피의 맛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주문 요청을 듣자마자 두뇌를 건너뛰고 바로 귀에서 입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 ‘아메리카노’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슈 크림 라테 어떠세요?
아마 포스의 직원도 생각하기 전에 말해버렸을 거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 ‘아메리카노’ 주문이 앞섰을 테니.
‘아. 네 그걸로 주세요.’
본사 쪽에서 슈 크림 라테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보고 때 좀 난처해질 것 같으니, 주문받을 때 쉬워 보이는 고객이 있으면 먼저 슈 크림 라테를 들이밀어 달라고 부탁이라도 받았던 걸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나는 음료를 받아 들고는 근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에 앉아 랩탑을 꺼냈다. 천천히 전원을 연결한 후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AP를 지정하며 슈 크림 라테를 한 모금 마셨는데, 너무 맛있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네. 새 봄 막 돋아난 잔디가 가득한 언덕의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선선한 바람에 살짝 움츠려 들었다가, 그늘 사이로 손등에 떨어지는 달달한 햇살 한줄기에 구원받는 그런 느낌이랄까?(나는 봄에 언덕을 올라 본 적도 없음)
요즘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힐링이 꽤나 인기 있는 키워드가 되었다. 주변에 힐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 미디어도 힐링을 주제로 한 콘텐츠들을 쏟아내니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료 한잔이면 바로 힐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힐링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하나 더하자면, 얼마 전 방송을 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효리네 민박 시즌 2의 여덟 번째 에피소드인가 그랬는데, 소녀시대의 윤아와 연기자 박보검이 민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때 남편인 이상순은 서울에 일하러 갔었고, 효리는 감기로 몸이 아파서 작업실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더랬다. 그래서 윤아와 보검은 정말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며 성실하게 민박을 운영했었다. 어느 덧 긴 하루가 지나고 윤아는 고생했던 보검을 숙소로 보낸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작업실로 들어왔는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효리. 그 둘이 잠들기 전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 아니 사실 별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 그냥 그렇게 뭔가 나지막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좋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윤아야. 내일 바다 보러 갈래?’
‘네, 언니.’
몸이 아플 때는 뭘 하자는 말이 잘 안 나오는 법이다. 저 때 효리는 정말 윤아랑 바다에 가고 싶었다는 걸 난 안다. 다음 날이 되어 보검은 아침을 준비하고, 윤아는 공항에서 상순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새로 올 손님에게 숙소를 안내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게르와 노천을 점검했다.
일을 다 마친 후 효리는 약속대로 윤아를 데리고 바다를 보러 갔고, 보검은 책을 한 권 들고 나와 햇살을 받으며 작업실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예상대로 책을 몇 장 넘기다가 이내 잠이 들어 버렸다. 멋들어진 대사도 없고 감동적인 BGM도 없는 스틸 같은 장면이었지만, 나는 그 따뜻해 보였던 햇빛을 바라보며 최고의 힐링을 느꼈더랬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라는 것처럼 어려운 질문이 없다. 뭔가 대충 이야기해놓고도 집에 와서 잠들 때 즈음에 다시 생각해보면 ‘아, 그걸 이야기했어야 했는데!’하게 된다. 사실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제대로 이야기할 자신은 없다. 행복이란 건 왠지 거창해야 할 것 같고, 최고로 즐거워야 할 것 같고, 남들이 들었을 때도 ‘와. 정말 그렇겠네’하는 반응이 나와야만 할 것 같으니까. 섣부르게 이야기했다가 ‘겨우 그 정도예요?’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살아온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져 우울해질지도 모른다.
대신 ‘최근 즐거웠을 때’, ‘요즘 힐링을 느꼈을 때’ 같이 최상급을 배제한 기간 한정의 가벼운 질문이라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것저것 부담 없이 쏟아낼 수 있다. 그런 질문이라면 최근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코인 세탁소에서 건조기 문을 열고 뽀송뽀송한 빨래 위에 엎어져 드라이 시트 냄새를 맡던 것
을 떠올리게 된다.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때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 금방 다시 기분이 좋아지니까. 서울의 집에도 건조기는 있지만, 크기도 작고 바닥 위에 바로 놓여 있어서 그때의 재연은 불가능하다. 엎드려 머리 정도는 밀어 넣을 수 있겠지만, 상상만 해봐도 힐링과는 꽤 거리가 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문을 발로 찬다면 목뼈에 깁스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앞으로 얼마 동안은 기분이 우울해지면 건조기 대신 슈 크림 라테를 마시며 ‘효리네 민박’의 저 장면을 생각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