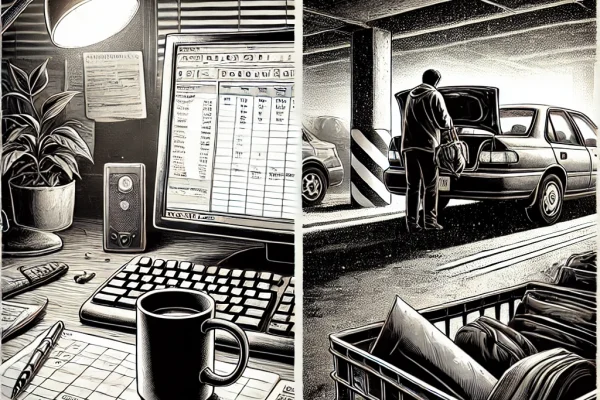어제는 비가 내렸다. 바깥은 계속 어두웠고, 가끔 창쪽을 보면 비가 오고 있던가 혹은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내리지 않을 때도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 봤자 어제의 창 밖은 하루 종일 비와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말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윤하의 노래가 듣고 싶어 졌다. 비가 올 때는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잠깐 멈췄을 때는 ‘먹구름’을 듣고 싶었다. 빗소리가 들릴 정도라면 ‘우산’도 좋았다. 그런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게으른 건 병이니까. 협탁 위의 폰을 드는 것조차 귀찮았던 나는 그렇게 비 오는 날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참 좋았다. 아침부터 햇빛에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날씨였다. 날씨 좋은 주말에 늘 그랬던 것처럼 랩탑을 가방에 넣어 메고는 천천히 서울숲으로 향했다. 한강 공원은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눈을 제대로 뜨고 달릴 수 없을 정도다. 나는 잠시 한강변에 자전거를 세우고 윤하의 곡을 검색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을 찾아 플레이리스트 맨 위로 올리고는, 다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한강변을 달렸다.
앞에서는 떼 자전거를 타는 무리들이 휘휘 지나가고, 주변에는 삼삼오오 앉아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윤하의 ‘비가 내리는 날에는’은 그런 광경의 BGM으로도 꽤 괜찮았다. 그 노래는 자전거를 타는 내 주위를 마치 다른 타임라인의 세상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녀의 곡 템포에 맞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천천히 움직이고,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천천히 재잘거린다.
어쩌죠 너무 보고 싶어요
잠에 들 수도 없죠
그대가 참 미워요
그대가 참 밉다는 이 클라이맥스 부분은 아무리 들어도 너무 보고 싶다는 말로 들린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이 참 잘 어울리는, 화창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