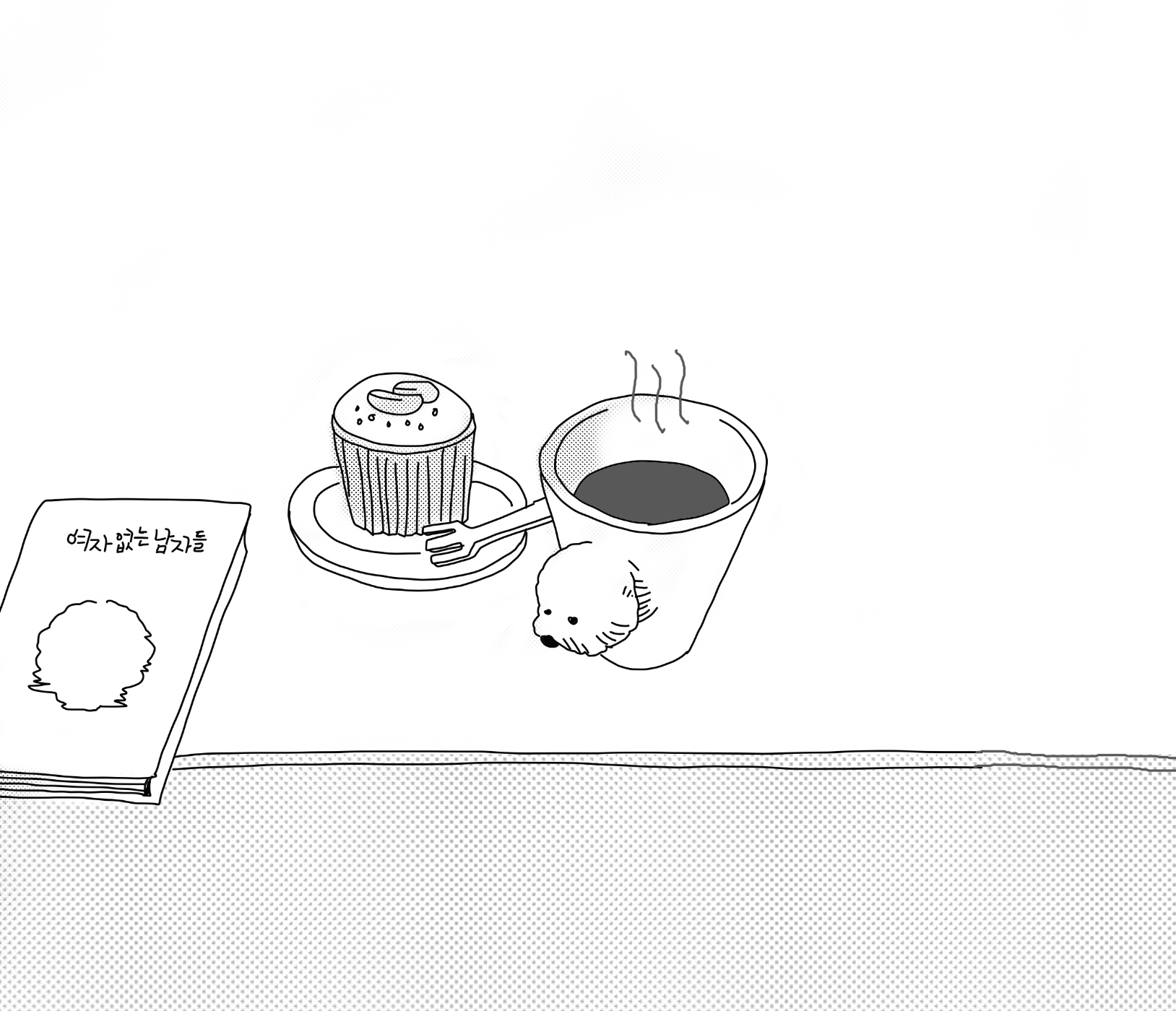샌프란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회사 컨퍼런스에 가는 길에 들렀던 적이 있다. 나도 이곳을 잘 모를 때여서 렌트를 해서는 대충 여기저기를 초행자처럼 함께 돌아다녔고,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 저녁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라스베이거스에 같이 가지 않겠냐며
“Expedia로 비행기와 호텔을 최저가에 예약할 수 있거든?”
한다. ‘그렇다고 게으른 내가 따라갈 것 같니?’ 하고 속으로 이야기하며 별생각 없이 그 앱을 다운로드하여 뒤적뒤적 비행기와 호텔을 검색해 봤는데
‘호텔이 공짜네…’
그랬다. 호텔 숙박비가 무료였다. 물론 그 대신 리조트 비가 하루에 25불씩 추가되지만 그 정도면 거의 거저잖아. 샌프란에 처음 도착해서 집을 구할 때까지 하루에 300불씩 내고 호텔에 묵었던 기억이 났다. 게다가 이곳은 컨퍼런스라도 개최되면 룸에 바퀴벌레가 날아다닐 것 같은 호텔도 하루 숙박비가 2000불 이상으로 뛰어버린다. 그런데 25불이라니, 찜질방 가격보다도 싸잖아. 게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이거스는 가까워서 항공비도 저렴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갔다.
대학교 때 귀찮아서 엠티도 잘 안 갔는데… 친구를 따라나선 된 가장 큰 이유는 라스베이거스 호텔 숙박비가 25불 이기 때문이 아니라, 샌프란의 호텔 숙박비가 300불이기 때문이었음.
친구와 라스베이거스에 오밤중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무척 더웠다. 사막 한가운데이니 더운 게 당연하겠지만, 정말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 친구 회사가 이곳에서 컨퍼런스를 자주 개최해서 그는 이 지역에 아주 익숙했는데, 아는 척 계속 떠들어대는 게 영 맘에 들지 않는다.
밤에는 아주 뜨겁지.(도착하자마자 이미 알았음)
낮에도 장난 아니게 뜨거워.(충분히 예측 가능함)
여기 호텔들은 엄청 크다고…(나는 눈이 없나?)
카지노가 먹여 살리는 곳이지.(궁금하지 않음)
여기 오면 요세미티에 꼭 가봐야 돼.(그랜드 캐년이겠지)
그곳에서 며칠 묵으며 내린 결론은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쇼를 감상하는 게 가장 남는다는 것. 물론 나는 쇼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자연을 보고 즐기지도 않으며, 도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거대한 벨라지오 분수 쇼도 트레비 분수 구경과 별 차이 없어 보이고, 예쁘다는 호텔도 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세트 같아서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밤이고 낮이고 너무 더워서 바깥에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도 안 든다. 덕분에 선택지가 쇼 감상 밖에 없었는데, 친구가 추천해 준 ‘카쇼’나 ‘오쇼’는 서커스로 옛날 서울에서 가끔 볼 수 있었다던 ‘목이 길어서 슬픈 여인’ 출현 서커스처럼 흥미 넘치는 주제도 아닌 것이다. 내가 이렇게 취향이 확실한 사람이었다니… 왠지 주체적인 인간이 된 것 같아서 뿌듯.
하지만 베이거스 사이트를 보면 그 외에도 수십 개의 쇼나 콘서트들이 올려지고 있어 게으르고 별다른 관심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도 흥미 있는 쇼를 고르는 게 어렵지 않다. 그 많은 공연 중 내가 고른 것은 ‘Rock Vault’였는데, 티켓팅을 할 때만 해도 일반 뮤지컬 배우들이 록 음악을 주제로 어설프게 퍼포먼스 하는 쇼인 줄 알았다. 그래도, 기분전환은 충분히 되겠지. 나는 락 마니아니까. 시간에 맞춰 호텔에 가서는 입장권을 발급받아 공연장으로 들어갔는데, 아담한 소극장에 가만히 놓여 있는 드럼 셋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편안해졌다.
공연이 시작되고 배우가 나와 서로 한참 떠들어대다가 드디어 연주 장면이 시작됐다. LA메탈 한참 유행하던 때의 패션으로 공연장에 등장하는 배우들. 긴 머리에 갈기 달린 가죽바지, 주렁주렁 단 체인에 근육 없는 몸매까지도 옛날 그대로 재현했다.
첫 곡은 Doors의 ‘light my fire’. 그런데 뭔가 사운드가 남다름. 기타 연주 실력도 엄청나고 보컬도 괴물 같아서 뭔가 계속 이질감이 느껴졌다. 저런 실력으로 왜 뮤지컬 배우를 하는 걸까.(뮤지컬 배우를 비하하는 것은 아님. 뮤지컬 배우라기엔 또 애매하게 부족함) 아메리칸들은 음악성이 남다르다더니… 하긴 AT&T 파크 옆에서 돈통 놓고 노래 부르는 노숙자도 노래를 잘 하긴 했었다. 그런데,
‘이건 좀 격이 다른데?’
수준이 엄청났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저 정도면 메인스트림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속 의심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에 Rolling Stones의 ‘HonkeyTonk Woman’ 도입부가 연주되고, 다른 보컬이 걸어 나오는데… 어? 저분은
‘맥콜리 쉥커 그룹의 Robin McAuley?’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틀림없었다. 이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옆에서 해머링을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는 Heart의 ‘Howard Leese’였고, 카우보이 모자를 쓴 베이스는 본 조비의 ‘Hugh McDonald’였다. Asia의 드러머였던 ‘Jay Schellen’, 전설의 Quiet Riot 보컬이었던 ‘Paul Shortino’가 묵묵히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나오는 사람마다 족족 과거에 날리던 뮤지션이었다.

한스무 곡 넘게 진행되는데 지미 핸드릭스부터 밴 헤일런까지 타고 올라오며 주옥같은 곡들만 들려주고, 관객들은 따라 부르며 환호와 박수를 멈추지 않는다. Heart의 ‘Alone’이나 Def Leppard의 ‘Pour some sugar on me’를 한 무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로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일로 앞으로도 이런 경험은 라스베이거스에 다시 오지 않는 한 경험할 수 없을 거다.
보통 이런 레전드의 공연이면 대형 무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리에서는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도 못할텐데, 이곳은 아담해서 그 사운드를 원 없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4명의 보컬과 7~8명의 탑 세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무대를 준비하는데 이 정도 퀄리티로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건 저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평생 음악으로 승부해 온 장인들의 실력과 자존심이 앰프를 통해 증폭되고 다시 스피커를 통해 공기를 밀어내어 내 몸을 흔들어댔다.
공연이 끝나 바깥으로 나오니 테이블에 전설의 뮤지션들이 일렬로 앉아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회사의 중역, 사업가 혹은 은퇴를 한 관객이라도 젊은 시절의 영웅 앞에서는 20대 소년이 되는 것이다. 그곳에서 기념품을 사면 뮤지션들이 사인을 해주는데, 장삿속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맥콜리 쉥커 그룹의 ‘Anytime’을 듣고 싶어 애플뮤직을 검색했지만 없어서 듣지 못했는데, 애플이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지금은 들어와 있음) 공연을 곱씹으며 호텔로 돌아가면서 지미 핸드릭스의 곡에서 기타 화형식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역시 호텔에 불이 나면 곤란하다.
그 후 AT&T파크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AC/DC가 공연을 하고 있었다. 마침 Rock Vault에서 들었던 ‘Highway to hell’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심장이 두근두근했었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