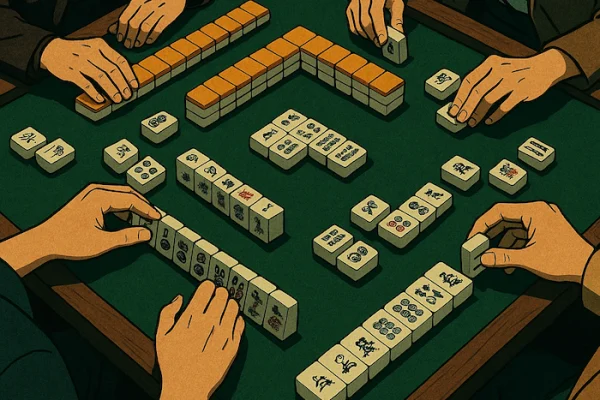출근시간의 강남역 지하통로에는 사람이 꽤 많다. 아니 아주 많다. 일부 커피를 들고 가거나 점심때 먹을 김밥을 사기 위해 통로 양 옆의 매장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시간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걷는 것에 집중한다. 물론 나도 열심히 걷는다. 생각해 보면 통로에서 걷는 것 외에 딱히 할 만한 다른 일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걷고 있는 내 오른쪽 옆으로 흰 패딩점퍼에 프릴치마를 입은 여자가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나를 앞질러 갔다. 그런데 그 걷는 모습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경쾌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쾌하다는 말을 꽤 많이 접해왔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장난 없게 경쾌했다. 혹시나 하고 주변을 걷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봤지만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혀 경쾌하게 걷고 있지 않았다. 그건 확실했다.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우울하게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침울했다. 마치 지옥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살인자의 영혼처럼, 인형사의 줄에 이끌리는 마리오네트 Marionette처럼… 걸음걸음마다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다. 점차 땅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다. 보고 있으면 어깨가 축 처졌다. 내 걷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나도 아마 비슷하게 걷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녀만은 달랐다. 나는 이 경쾌함의 근원이 뭔지 파악하고 싶어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녀의 시선이다. 한마디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주변의 여기저기를 가볍게 살펴보지만, 어느 한 군데에 머무르거나 마음을 주지 않는다. 말 그대로 솜털처럼 가볍게 주변을 스쳐가는 시선이다. 다음은 손의 움직임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옆에 붙이거나, 주머니에 구겨 넣고 있지 않았다. 핫팩을 들고 있지만, 추워 죽겠다고 꽝꽝 얼어버린 고등어처럼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지작거리며 흔들고 있다. 그건 마치 핫팩이 아니라 깃털 같았다. 그 가벼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 손목의 스냅이며, 그것의 원동력은 힘이 아니라 리듬이다. 일정한 패턴이 없는 리듬. 그 덕에 핫팩은 세상에 없는 창의적 패턴으로 예측불가능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다이너미즘 덕에 한 시간이라도 싫증 없이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걸음이다. 저런 경쾌함을 만들어내는 일등 공신은 바로 다리의 움직임일 거다. 물구나무로 걷지 않는 한 경쾌한 걸음은 다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테니까. 걸음의 다른 점을 찾아내기 이전에 너무도 경쾌했다. 그녀의 걸음이 경쾌한 이유를 찾는 건 모나리자가 아름다운 이유를 찾는 것처럼 불경스러운 일로 느껴졌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느낌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았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봤자 증오, 질투, 잔인성, 분노,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만 튀어나올 뿐이다.
하지만 논리적 접근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얕은 현상은 없다는 믿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 결국 다른 점을 찾아내고야 말았는데, 그녀는 걷기 위해 앞으로 다리를 내밀어 내리기 전 발끝으로 살짝 허공을 차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다른 어떤 사람도 물리적인 흉내로 그녀와 같은 경쾌함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그녀의 독보적 경쾌함의 이유를 더 이상 관찰할 수 없었다. 그녀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갔기 때문이다. 제대 이후로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않기로 결심한 나는, 그녀가 경쾌하게 에스컬레이터 위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배웅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경쾌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세상 모든 사람의 걸음이 경쾌해지기를 바라본다.(물론 불가능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