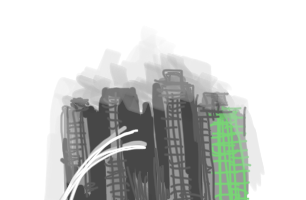한국에서는 작은 서점들이 동네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다. 가끔 가뭄에 콩 나듯 만난다 해도, 학교 근처에서 교제나 문제집을 판매하는 문방구 겸업 매장들 뿐이다. 어렸을 때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로컬 서점에 들러 이런저런 책들을 구경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내겐 동네 서점이 사라졌다는 건 조금 아쉬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것에 비해 샌프란시스코나 시드니의 거리를 걷다 보면 작은 서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전문서적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오래된 서적을 판매하는 헌책방 같은 곳도 있는데, 언제나 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다.
몇 년 전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호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며칠 집에만 죽치고 있었더니 제발 좀 나갔다오라고 하며 알려준 게 뉴타운이었다. 대학가라 홍대 근처 같을 거라고 했지만, 서울에서도 홍대 쪽을 안 간지는 꽤 오래되어서 어떤 느낌일지 감이 오질 않았다. 역을 나와보니 홍대보다는 인사동이나 황학동 같았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바람을 쐬니 기분이 좋았다.
그때 길을 걷다가 한 작은 서점을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신간 밑에 해당 서점의 점원들이 적어놓은 200자 내외의 독특한 서평이 함께 붙어 있었다. 그건 우리나라 대형서점의 설명 레이블과는 달리 책을 팔 기 위한 미사여구보다는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성실하게 담고 있었다. 그 서평들은 가끔 실랄한 비평도 서슴지 않고 있어 더 신뢰가 갔다. 그때 즈음 꽤 유명했던 ‘Fifty Shades of Grey’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유명세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고 처분하시길’ 같은 서평이 달려 있었다.(그래도 난 사고 싶었음)
그 근처의 다른 서점에는 책을 갱지로 꽁꽁 포장해서 제목이나 내용을 엿볼 수 없게 해 두고, 그 위에 책을 대표할 수 있는 – Complex crime, Edinburgh, Regret, Vengeance, This time it’s personal 같은 – 키워드를 매직으로 찍찍 적어두고 판매하는 섹션도 있었다. 유성매직으로 하도 꾹꾹 눌러써서 갱지 뒤쪽으로 잉크가 배어나와 책에 묻었을 것 같았지만, 어차피 나는 안살꺼니까.
대신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별다른 목표의식 없이 서점에 들르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 앞에서 꽤 오랫동안 포장지 안에 무슨 책이 있을지 열심히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책을 구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답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히 ‘애거서 크리스티’의 책이었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애거서 크리스티’의 책이었다!(알게 뭐람)
거리두기도 살짝 완화되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서점에 한번 들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