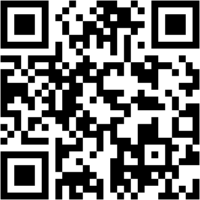사실 요즘에는 특별한 날 분위기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거리 여기저기에서 캐럴이 흘러나오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보신각 종소리가 도시 가득 공명했었다. 그때는 한창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여서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한몫했을 거다. 사람들은 서로 선물도 나누고 새해 인사도 다녔다. 뭐든 대부분 몸으로 부딪치면서 얻어냈다고 할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가 싶지만, 그때 즈음에는 음악을 만들 때도 릴 테이프에 녹음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가위로 오려 붙였다고 한다.(정말인가요?)
저작권 관련 인식이 높아지면서 길거리에 음악이 사라진 게 꽤 크긴 했다. 길거리의 음반 판매 노점상들도 저작권이나 매체의 변화로 사라지게 되고, 그 여파는 대형 레코드점도 피해 가기 힘들었다. 그런 이유로 더 이상 음악은 공간을 채우며 대중 사이를 연결해주지 못했다. 헤드폰을 통해 내 머리 근처에 머물게 된 음악은 니어필드용으로 편곡되어 공간감보다는 디테일에 치중하게 되었고, 대신 도구의 발전으로 인디나 언더의 실력자들의 일인 프로듀싱으로 대중음악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열리기도 했다. 그 대신 거리는 조용해졌다.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공존과 소통보다는 생존과 자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요즘 대학생들은 이전 같은 문화의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스펙 쌓기나 영어공부에 더 신경써야 한다. 모바일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며 중간 연결 비즈니스를 초토화시켜버렸고, 비대면 시대를 앞당겼다. 이제는 스마트폰 터치 서너 번이면 새해인사도, 생일선물도 바로 전달할 수 있다.
변화를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예전부터 문화로 정착된다는 건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장벽을 넘어야 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붓에서 펜으로, 마차에서 증기기관으로의 트랜지션에도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노인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인 프로세스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다. 문화의 변화는 진화와 그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무화과의 꽃이 열매 안쪽에 피거나, 개구리의 꼬리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테크놀로지와 이를 활용하는 테크 혹은 SNS 기업들이 이 변화를 주도해가기 시작했다.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세대를 공략하고 그 프레임웍을 강제로 확산시켰다. 노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와이파이를 잡아야 했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스크린 위의 가상 키보드를 두드렸으며, 내가 주문하고 싶은 메뉴가 보이지도 않는 키오스크 앞에 서야 했다. 아직 실체도 없는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벌써부터 지쳐버리게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래전부터 비슷한 일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정말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인가에 대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필요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과 시간이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다. 검증이 제대로 되고 모두의 암묵적 동의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인간의 수명은 – 좀 늘긴 했지만 – 여전히 백 년 안쪽이다. 영원히 살고 싶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운명은 지구의 다른 생명체와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탄생의 기적을 잘 누리고 소멸하는 건 인간의 소명이다. 그리고, 그건 모든 동식물의 소명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소명이 시스템이나 프레임웍에 의해 휘둘리는 건 인간이 유일하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테크놀로지가 행복한 삶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개념적으로 오프라인과의 연결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바일 플랫폼과는 또 다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리셋하게 되어버릴 메타버스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소설이나 영화 속의 근 미래가 모두 디스토피아인 것에는 이유가 있다.
테크놀로지 안에서 사람 간의 연대나 유대가 사라져 버리고 따뜻한 체온이 내 주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외로운 일일 거다. 하트를 눌러주는 십만 팔로워보다는 내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토닥거려주고, 손 잡아주는 친구 하나가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한 해의 시작을 여유 있게 하고 싶어서 새해 첫날 아침, 신해철의 ‘먼 훗날 언젠가’를 계속 돌려 들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곡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무엇보다도 가사가 너무 예쁘다. 듣고 있다 보면 구원을 받게 될 것만 같다. 2022년 인류에겐 구원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