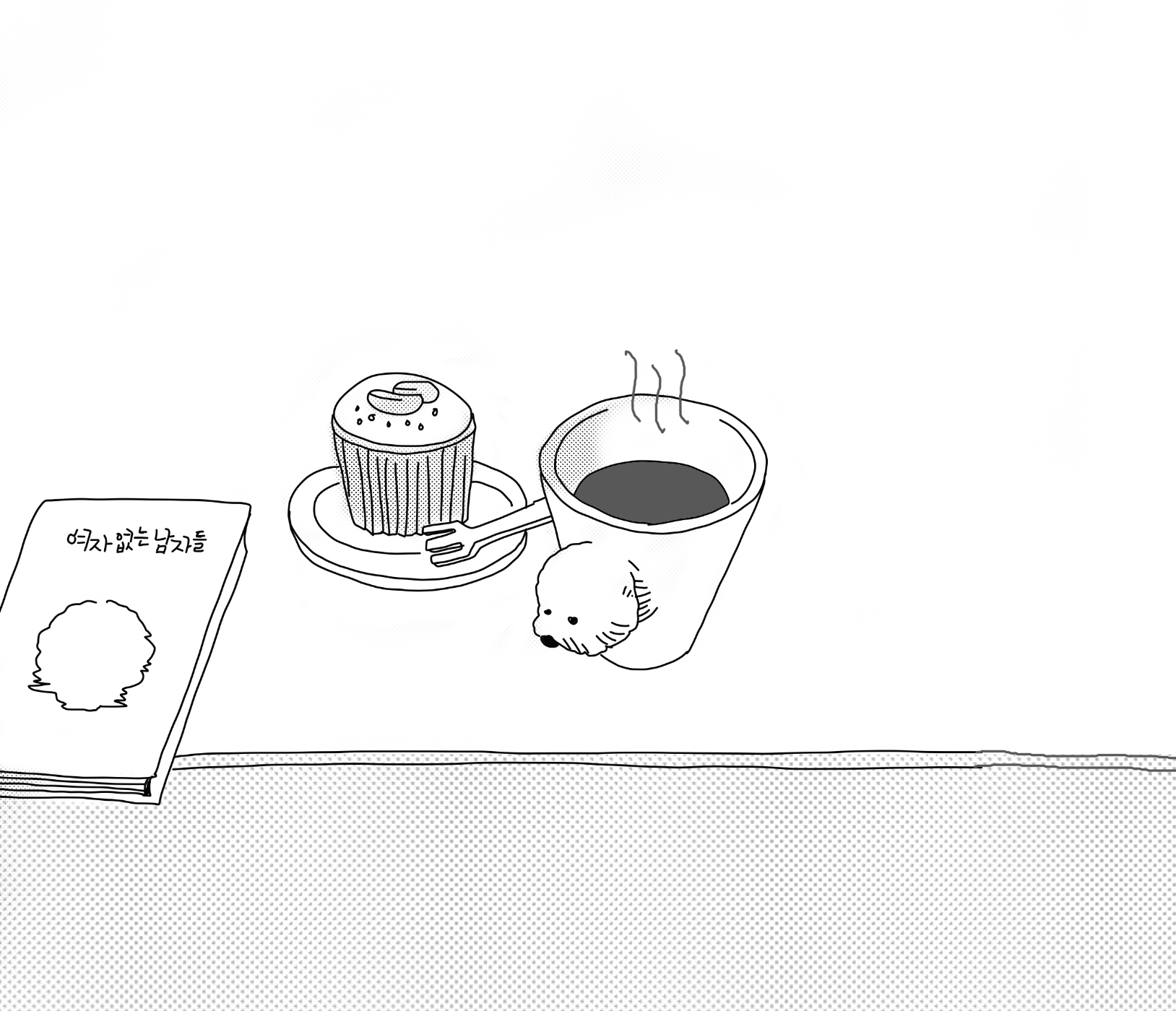나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반해 남동생은 대부분의 운동을 다 좋아한다. 가구별 운동 선호 총량의 법칙 같은 건가? 그 애는 집에 있을 때 거의 스포츠 방송에 빠져 사는데, 야구, 농구, 골프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보기엔 정지화면과 다를 바 없는 마라톤 까지도 진지하게 시청한다. 마라톤은 선수들이 대부분 비슷한 페이스로 큰 변화 없이 달리기 때문에 해설자들 조차 지루해하는데 말이다. 기껏 해 봤자 앞사람을 제치는 상황 정도가 큰 이벤트인데, 축구나 농구에서는 그런 건 너무 흔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 변화도 없는 데다가 설명할만한 기술이나 규칙도 없어서 해설자들은 경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더 집중하는데, 그런 이유로 마라톤 방송은 스포츠 중계라기보다는 만담 프로 같다.
‘올여름은 정말 더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큰 맘먹고 에어컨을 좋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습 기능이 있는 건가요? 올해는 장마가 길데요.’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있나?’
‘선수들도 다들 에어컨을 장만했겠죠?’
‘러시아 선수는 필요 없을 거예요. 추우니까.’
‘러시아는 이번 마라톤에 참석 안 했는데…’
이런 식이다. 내가 보기엔 마라톤 해설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쨌든, 남동생은 그런 시답잖은 이야기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마라톤을 시청할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다.
그런 남동생이 야구를 보기 위해 내가 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바닷가 근처에는 AT&T 파크라는 큰 야구장이 있다(지금은 오라클 파크로 이름이 바뀌었음).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가볼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넓고 분위기도 평화로웠다. 우리는 푸드코트에서 팔뚝보다 큰 핫도그를 사들고는 미리 예매해 둔 자리를 찾아 앉았다. 맞은편의 외야 뒤쪽이 바로 바다여서 힘이 넘치는 타자라면 볼을 요트까지 쳐낼지도 모른다.
이윽고 야구 게임에서 들어봤던 익숙한 오르간 소리가 들렸고, 관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녹음된 것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라이브 연주라고 한다.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에 야구를 잘 모르는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하지만, 스포츠에 원래 관심이 없었어서 그런지 게임이 시작되자 이내 지루해졌다. 그 지루함을 잊기 위해 동생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타자가 친 공이 포수 위쪽으로 플라이볼이 된 것을 포수가 잡자 사람들이 열광함)
– 공 잡은 것뿐인데 왜 저렇게 좋아해?
‘아웃 카운트 하나 늘었잖아.’
– 그게 왜?
‘…..’
(타자가 친 공이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걸 외야수가 잡다가 떨어뜨림)
– 저걸 왜 놓쳐?
‘저게 쉬운 게 아니야. 뛰어가면서 받아야 하잖아.’
– 그러면, 멈춰 서서 받으면 되잖아.
‘…..’
– 150 키로면 너무 구속이 느린 거 아니야? 메이저 리그면 160 넘어야지.
‘그런 사람 메이저 리그에도 별로 없어.’
– 랜디 로즈 있잖아.
‘랜디 존슨이야…’
– 왜 저렇게 못 쳐. 150킬로 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빨라.’
– 우리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
– 와. 사이클 히트네!
‘텍사스 안타겠지.’
– 오! 풀하우스가 됐어.
‘풀 베이스야.’
‘선수들 등에 이름이 없고 백넘버만 있지? 우리나라에서도 SK가 따라 했다가 욕먹은 적이 있지. 선수를 못 알아보니까.’
– 등에 이름이 있었어?
‘….’
– 범가드 수염이 왜 저렇게 지저분하니?
‘범가너 야…’
범가드 침 뱉었다. 저래도 돼?
‘범가너라고!!’
다음 날 남동생은 내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야구를 보러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