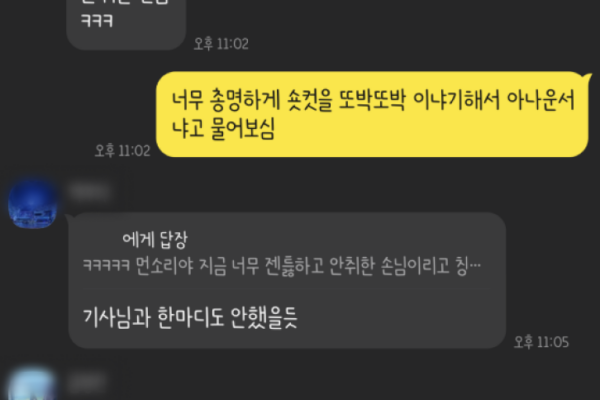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다. 조금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몸에 힘이 들어가면 통증이 천둥처럼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 통증은 밖을 걸을 때도,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그리고, 저녁에 자려고 누울 때까지도 마치 입술 가장자리에 생긴 물집처럼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다가 주말 오후 거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 ‘딸깍’ 하고 스위치가 꺼지듯 –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오랜만에 자전거를 끌고 한강 공원으로 나가서는 트랜스 픽션의 ‘내게 돌아와’를 들으며 서울 숲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이 곡은 가사를 신경 안 쓰고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곡이니까.
올해 여름은 한 달 내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했던 지겨운 비구름, 잦아들 듯하면서도 계속 옆에서 괴롭혔던 코로나. 그리고, 자세를 바꿀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다리 통증뿐이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계절이 끝나버렸구나 싶었는데, 강변을 달리다 보니 다음 주자인 가을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다.
재미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고 보니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버릇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렸을 때는 뭐든 어설프고 시시해서 재미가 없었다. 남이 가르치는 걸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도 싫었고, 음악도 어느 순간 듣는게 지겨워졌으며, 기타도 몇 달 동안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내려놓기 일쑤였다. 뭐든 시큰둥했고, 시간은 어영부영 흘렀다.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후배에게 혹은 여자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재미있는게 별로 없다고…
주변에서도 마스크를 얼굴에 달고 사는 요즘이 인생에서 최고로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의 경우 그 이전에도 딱히 인생이 엄청나게 즐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지루함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도 – 투덜대고 있긴 하지만 – 다들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은 지루하기 짝이 없고 고통의 연속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처는 아물었고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졌다. 회복 불능이라 생각되던 상처에도 새살이 돋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미소 지을 일들이 생겼다. 물론 새옹지마 塞翁之馬라고 그 뒤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인생은 늘 그런 거지.’ 하고 대충 넘겨버리면 그 순간을 충실히 마주 보며 즐길 수 있게 된다.
온 세상을 가라앉힐 기세로 퍼붓던 검은 하늘이 갈라져 다시 파란 하늘조각을 볼 수 있게 된 것 만으로 다시 이 지루한 세상을 버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조금만 –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 견디면 분명히 스위치는 ‘딸깍’ 하고 그 상황을 정리해줄 거다.
그건 그렇고, 2022년의 가을도 저물고 있다는 거...